[서공석 신부의 신학산책 - 6]
말은 언어의 정신 · 신체적 집행(執行)이다. 이 집행은 언어가 지닌 표지(標識)의 한정된 체계 안에서 인간이 자유롭게 그 표지들을 조립하여 이루어진다. 말은 한정된 언어 체계를 기반으로 무한한 조합을 하여, 두 주체간의 관계를 구성한다. 언어가 장기판의 어느 한 순간 상태라면, 말은 두 사람의 놀이를 발생시키는 장기짝들의 움직임과 같다.
언어에는 외적 관계가 없다. 사전은 단어를 단어로 설명하지만, 하나의 언어 폐쇄회로(閉鎖回路)와 같아서 그 언어 안에는 주체들의 움직임이라는 것이 없다. 그러나 그 언어를 사용하여 사람이 말할 때, 말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의 움직임이라는 언어 외적 사건이 발생한다.
하느님이 말씀하신다고 말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하느님에게 근거가 있는 언어가 자기를 움직인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우리는 말씀-사건이라 부른다. 신앙은 말씀-사건으로 나타난 어떤 실재를 알아보고, 놀이를 발생시키는 힘이다.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루카 17,10)라는 말은 말씀-사건 앞에 그리스도 신앙인이 보이는 반응이다. 유대교에서는 할 일을 다 했으면, 보상을 받아야 한다.
‘나병환자 열 사람을 낫게 한 이야기’(루카 17,11-19)가 있다. 열 사람이 치유되었지만, 그 치유를 말씀-사건, 곧 하느님이 하신 일로 받아들이고 하느님 앞에 인간이 하는 놀이를 발생시킨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루카 17,15-16)〕
하느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할 때, 언어의 객관적 체계가 무시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텍스트의 내적 구조를 무시하고,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주관적 해석을 하지 말아야 한다. 언어 체계를 무시하고 통용되는 언어의 예를 들어보자. 예수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은 사실은 예수가 요한의 세례 운동에 가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흔히들 하는 해석에 의하면 예수는 죄 없는 분이었지만, 겸손하게 죄인과 스스로를 동일시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말한다. 겸손이라는 덕목(德目)에 힘을 실어주기 위하여, 신약성서 텍스트의 언어 구조를 손상시킨 경우다.
언어 텍스트의 구조를 무시한 또 하나의 예를 보자. 가톨릭교회가 결혼의 불가해소성(不可解消性)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하느님이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마태 19,6)는 구절이다. 그 언어는 한 번 결혼하면,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 하느님이 맺어주셨으니, 부부 두 사람은 각자 자기 스스로를 앞세우지 말고, 하느님이 두 사람 사이에 살아 계시게 살라는 말이다. 하느님이 두 사람 사이에 살아 계시면, 두 사람은 서로에게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실천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갈라설 일이 없을 것이다. 사람은 자기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처신하기 때문에 쉽게 갈등하고 갈라선다.
인간의 ‘놀이’를 보여주는 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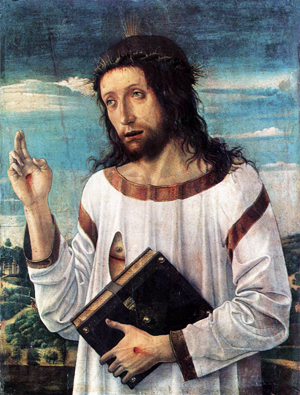
그러나 신약성서는 예수의 인간 조건을 부인하지 않는다. 예수가 인간으로서 행한 모든 실천이 하느님 말씀의 차원과 질(質)을 가졌다고 이해해야 한다. 예수는 사람의 놀이가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달라지는 말씀-사건을 보여 준 인물이다.
계시는 인간이 스스로 지배할 수 없는 것을 사자(使者)를 통해서 하느님이 사람들에게 알려 주신 행위를 의미한다. 예언자는 이 계시의 대변자이다. 복음은 계시라는 단어를 예수에게 적용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리스도 신앙이 사용하는 계시 개념에는 일련의 역사적 사실들이 들어 있다. 예수의 삶, 죽음, 부활이다.
계시는 체계화된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살과 피를 지닌 인간의 놀이를 보여준다. 신앙은 예수라는 한 인물의 역사를 전하면서 우리의 놀이 혹은 우리의 역사에 변화가 일어날 것을 촉구한다. 복음서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복음은 예수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 곧 우리의 삶이 만나서 우리의 삶 안에 변화가 일어날 것을 촉구한다.
계시는 스스로 자기의 공간을 정립한다. 예수는 당신의 행위와 제안이 올바르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보여 달라는” 바리사이들에게 예수는 표징을 주지 않는다(마르 8,11-13). 볼 눈이 있는 사람은 보는 것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듣는 것이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하는 것이다(마태 19,12).
계시를 하느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기 위해 다른 외적 요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예수가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였기에, 혹은 기적을 행하였기에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다. 이 점에 대한 오해에서 기적을 빙자하며 효과를 내려는 갖가지 시도들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일부 성령운동, 꽃동네, 미리내 성삼 수도회, 나주 율리아 등에서 들리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런 효과를 노리는 시도들이다.)
‘언어’로 전달된 신앙체험, 그 역사성 고려해야
계시는 말씀-사건이다. 언어는 말하는 사람의 뜻과는 전혀 달리 해석될 수 있다. 이것을 언어의 다의적(多義的) 성격이라 부른다.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용한 언어의 다의성을 없앨 수 없다. 따라서 다의성은 언어의 전달 과정에 항상 있다. 그리고 말을 듣지 않겠다는 사람을 듣게 만들 수는 없다. 듣지 않겠다는 사람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계시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의 실천들을 전하는 언어 안에서 자기 자신을 위한 말씀-사건을 체험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 언어는 그분의 실천을 언어화한 사람들이 동시대 사람들을 위해 취사선택하여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말씀-사건은 인간 언어의 다의성으로 말미암아 모호함을 갖는다. 예수가 행한 기적들도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을 위해 명백한 것은 아니었다. 그 모호함 때문에, 제자들은 그분 안에 하느님의 손길을 보고, 반대자들은 베엘제불의 활동을 보았다(마르 3,23-24. 마태 12,24. 루카 11,18-19).
계시 언어가 이렇게 인간적 성격을 지녔다는 것은 계시가 특수 언어를 갖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 안에서는 전통적으로 사용된 표현을 상대화하면 대단한 저항이 따른다. 흔히 공의회의 교의(敎義)는 사용된 언어와 동일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언어는 인간의 것이고 인간의 책임 하에 있다.
신앙체험 혹은 놀이는 그 시대의 언어로 포장되어 전달되었다. 그 언어는 그 시대 사람과 하느님을 연결시키는 말씀-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 안에 살아가는 인간의 언어이기에, 그 언어의 역사성은 고려되어야 한다. 모든 시대에 통용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는 없다.
하느님 말씀은 인간 예수의 삶을 통해 전해진다
예수를 하느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다른 말들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예수의 지상 생활, 곧 그분의 놀이를 배제하지 않는다. 부활하신 분의 무덤이 비어 있고, 그분을 갈릴래아에서 만날 것이라는 빈 무덤의 메시지는 그분이 살아서 활동하실 때 발생한 이야기들 안에서 그분을 만나라는 말이다. 그분은 갈릴래아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활동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분의 지상 생활을 제외하면,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된다. 예수는 하나의 사상 체계를 전달하지 않았고, 하느님의 나라를 주제로 한 일련의 실천을 보여주었다. 하느님의 말씀은 인간 예수의 삶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졌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말을 하느님의 것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놀이에 상반되지 않아야 한다. 예수를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전달된 그분 생애에 대한 이야기들 안에서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뜻이다.
복음 텍스트의 형성에 초기신앙공동체들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였다. 공동체들은 예수를 회상하여 기록하면서, 하느님 말씀의 보편성 때문에 그 시대의 새 청중을 위해 필요한 것을 첨가하고 수정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라 생각하였다. 그들은 예수가 실제로 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그분이 한 것처럼 만들기도 하였다. 그것은 현대 실증주의에 물든 우리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지만, 많은 가르침이 그 안에 들어 있다. 예수를 직접 접촉하지 않았고 전혀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성령으로 그들 안에 살아 계신 예수가 말씀하신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다. 〔토마스 사도에게 “보지 않고도 믿는 이들은 복됩니다”(요한 20,29)라고 예수가 말씀하셨다는 것은 요한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 신앙공동체에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 신앙인이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초기 신앙공동체가 그런 동기로 예수의 말씀과 행적을 각색(脚色)하고 윤색(潤色)한 것은, 예수의 말씀과 행적이 특정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지만, 그 메시지는 보편성을 지녔다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다. 새 청중을 위해서는 새롭게 말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들이 체험한 구원이다. 예수가 부활하였다는 초기 신앙공동체의 믿음은 그 구원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였다. 그들은 그들이 각색하고 윤색한 언어가 예수의 부활 사건으로 발생한 그리스도인들의 놀이를 전하는 것이면, 예수의 메시지를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다.
서공석 신부 (부산교구 원로사목자)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