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대의 신학자]
파스카 성삼일의 대단원이자 교회력의 중심인 부활성야 예식은 성체성사로 절정을 이룹니다. 부활의 촛불이 이 땅에 드리워졌던 혼란과 외로움을 거두어 내고, 구약과 신약을 가로지르는 신과 인간의 드라마가 세 시간의 마라톤 미사를 통해 재현되면, 수난감실을 벗어난 성체가 마침내 우리 앞에 눈부신 모습을 드러내죠. 파스카의 신비가 새삼 벅차게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성체성사를 통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빵과 포도주가 되어 우리들의 몸과 피와 일치를 이루고, 그의 부활은 곧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야 할 우리들의 부활이 됩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파스카의 성체가 이렇게 신비로운데, 중세유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땠을까요? 신의 살과 피가 빵과 포도주가 되어 인간의 살과 피와 섞인다니요! 신화와 전설이 현실과 채 분리되지 않은 세상 속에 살던 중세인들에게 성체성사는 아마도 어마어마한 기적의 체험이었을 겁니다. 성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슬쩍 감춘 어느 욕심쟁이의 손이 그만 시든 나뭇가지처럼 곱아버렸다던가, 성체성사에 사용될 빵을 구웠던 오븐에 남아있던 빵 부스러기가 잘린 손가락의 형태로 발견되었다던가, 이런 신기한 이야기들이 사실처럼 믿어지곤 했다지요.
중세인들에게 성체는 이렇게 금기와 두려움의 영역이었지만, 또 한편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지는 마르지 않는 신비였습니다. 우러름 받던 교황의 몸이건, 천대받던 시종의 몸이건, 성체는 구분도 거리낌도 없이 부서지고 섞여 그들의 몸과 하나가 됩니다. 특히 교육과 정치권력의 사각지대에 살던 평신도들에게 성체는 하느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었던 유일한 통로였지요. 그러기에 성체는 언제나 “위험한 물질 (dangerous matter)”이었습니다. 교회 권력에 의해 선점되고 이용되던 훈육의 도구였던 동시에, 언제라도 그 권력을 통째로 흔들 수 있는 괴력을 지니고 있었죠. 종교개혁의 핵심적 화두가 성체에 관한 논쟁이었었던 사실을 통해서, 또 성체성사를 통해 기적을 체험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 많은 신비가들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성체성사가 중세인들에게 미쳤을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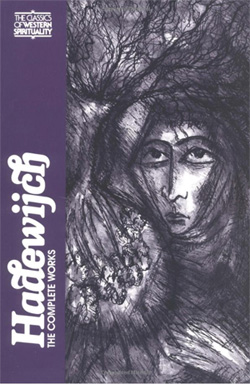
지난 번 스킬레벡스에 관한 글에서 잠시 언급했듯, 베긴회의 기원과 발전은 중세 후기 유럽,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인 평신도 영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12세기 유럽은 정치경제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습니다. 무역의 발달로 인한 상권의 형성, 절대왕권으로 대변되는 세속 권력의 성장으로 인해 중세 후기사회는 서서히 교황과 교회의 권위가 지배적이었던 “그리스도교 왕국”으로부터 탈피할 기반을 마련하죠. 이 시기 축재와 권력다툼으로 부패해가던 제도교회와는 반대로, 평신도들의 신앙적 열정은 높아만 갔습니다. 소위 “이단”으로 교회사에서 판정된 평신도 공동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발생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이지요.
13세기 새로운 여성 독신그룹, 베긴회
베긴회의 기원과 발전 또한 다른 평신도 공동체들의 기원과 발전과 맥락을 같이합니다. 그러나 베긴회는 회원들이 모두 여성이었다는 것, 교회권력과 꽤 긴 시간 상보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여타의 공동체들과 구별됩니다.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 베긴회원들은 뜨거운 감자와 같은 존재였던 듯싶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여성들의 지위와 관련이 있죠. 중세 유럽사회에서 여성이 택할 수 있는 삶의 형태는 단 두 가지였습니다. 결혼 아니면 수도원에 들어가는 거였죠.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집안끼리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관계에 의해 성사되는 결혼보다 수도원에 들어가고 싶어 했으나, 수도원 또한 신심만으로 입회가 허락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성혐오주의가 만연했던 당시의 교회와 남성수도회는, 여성이 수도자가 되는 것은 오히려 교회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죠. 뿐만 아니라, 수도원 입회를 위해서는 결혼에 드는 비용 못지않은 담보물이 필요했기에 여간한 지위와 재력이 없이는 꿈꾸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베긴’이라 불리는 이 여성들은 이러한 제도적 규제를 벗어나, 대담하게도 수도회에 적을 두지 않은 채 독신선언을 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단순한 삶을 모범으로 삼아 살기 원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산발적으로 하나 둘씩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다가 이내 커다란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죠. 베긴회가 형성되던 초기, 교회는 늘어나는 여성들의 수도회 입회 요구를 자연스럽게 해결해주는 동시에 교회가 미처 손을 뻗치지 못하는 마을 구석구석의 궂은일과 기본적인 평신도 교육까지 도맡아 주는 베긴회를 반가운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전성기였던 12세기 말과 13세기 초 베긴회가 여느 수도회 못지않은 규모로 성장하게 된 배경이죠.
베긴들은 은둔의 삶보다도 요동치던 세상의 중심 속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들을 보살피는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신들의 소명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뜨거운 신심은 결국 교회의 눈 밖에 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교회권력은 베긴회의 존재가 자신들의 존재를 위협할 만큼 두루 신뢰를 쌓아가며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내 교회와 베긴회의 갈등이 시작되었죠. 13세기 후반부터 베긴회는 이단시비와 마녀혐의로 잦은 고충을 겪게 되었고, 마침내 서서히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내 심장과 내 육체가 더 없는 환희로 떨며..헤데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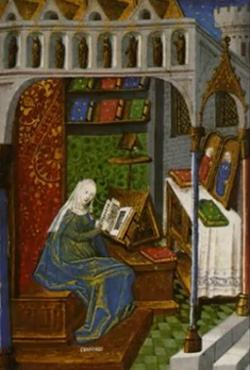
아가서에 나오는 사랑표현을 당시 유행했던 궁정로맨스 문학의 용어와 형식과 절묘하게 엮어 하느님과 영혼의 관계를 묘사한 그녀의 시들은 대단히 감각적이고 아름답습니다. 헤데비치는 삼위일체 신학을 비롯, 많은 신학적 주제들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성체성사에 관한 부분은 충격적이라 할 만큼 과감합니다. 아래 글은 헤데비치가 성령강림축일에 경험한 성체성사의 신비를 기록한 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사람의 옷을 입은 채 내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게 당신의 몸을 허락하셨던 그 첫날과 같은 모습이셨지요. 빛나는 용모를 가진, 놀랍게도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이셨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이에게 완전히 몸을 내어 맡기듯, 그렇게 순하게 그는 내게 오셨습니다. 그는 우선 관습대로, 성체성사의 형태로 그의 몸을 내게 주셨고, 또 성작을 주어 그 형태와 맛 그대로 들이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는, 그 자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내게 가까이 오셔서는, 그의 품 안으로 나를 끌어당기시고 힘차게 안으셨습니다. 내 온몸, 내 심장과 내 육체가 더 없는 환희로 떨며 그의 온몸을 느꼈습니다. 나는 더 바랄 것 없이 만족스러웠고, 넋을 잃을 만큼 황홀했습니다.” (헤데비치, 일곱 번째 비전)
마치 은밀한 사랑의 첫 경험을 털어놓듯, 헤데비치는 성체성사의 설렘과 떨림을 생생하고 친밀한 언어로 표현합니다. 네덜란드의 학자인 폴 모메어스 (Paul Mommaers)는 헤데비치의 글과 신학이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는” 방식을 표현하는데 있어 당시 주류 신학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고 말합니다.
몸과 영혼의 이분법적 구도를 고수하며, 오로지 영적인 부분만이 하느님께 다가갈 수 있다고 믿었던 주류 신학자들과는 달리, 헤데비치의 신학에는 몸과 영혼이 함께 숨 쉽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열어 하느님을 만나고자 하는 신학이고, 그렇게 하느님과 가까워 지고자 하는 신학이죠. 손끝의 감각, 체취, 불타는 욕정, 때로는 변덕스럽고 서운하고 안타까운 감정들조차도, 헤데비치에게는 버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랑에는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신심이란, 사랑이란, 그렇게 헤데비치의 삶에 밀착되어 있는 것이며 그녀의 삶과 하나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체성사는 그러한 헤데비치 신학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성체성사는 그녀의 몸과 영혼을 일깨우는 가르침이자, 응답이자, 도전이었습니다. 또한, 권력과 고등교육의 중심으로부터 한참 떨어져 있었던 헤데비치를 오늘 날까지 두루 읽히는 신학자로, 나아가 하느님의 연인으로 성장시킨 교육의 장이자 사랑의 산실이었습니다.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혹은 의무적으로 영성체를 해오셨다면, 이번 주에는 주님의 몸과 피가 여러분의 몸과 피와 하나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느끼고 생각하면서 성체성사를 준비해보십시오. 주님의 몸과 피가 혀끝에 닿고 식도를 지날 때, 여러분은 헤데비치와 같이 설레시는지요? 헤데비치와 같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그의 몸과 마음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는지요?
헤데비치에 관한 서적들
<Hadewijch: The Complete Works> (Paulist Press, 1980)
베긴과 중세 여성신비가들에 관한 참고 서적들
<여성과 그리스도교 2>, 메리 T. 말로운 지음, 안은경 옮김 (바오로딸 2009); <Beguine Spirituality: Mystical Writings of Mechthild of Magdeburg, Beatrice of Nazareth, and Hadewijch of Brabant> edited by Fiona Bowie and translated by Oliver Davies (Crossroad Pub Co (May 1990); <Power, Gender and Christian Mysticism> by Grace Jantze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Holy Feast and Holy Fast: The Religious Significance of Food to Medieval Women> by Caroline W. Bynum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8); <Sensible Ecstasy: Mysticism, Sexual Difference, and the Demands of History> by Amy Hollywoo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2); <Meister Eckhart and the Beguine Mystics: Hadewijch of Brabant, Mechthild of Magdeburg, and Marguerite Porete> by Bernard McGinn (Continuum, 1997); <Hadewijch: Writer - Beguine - Love Mystic > by Paul Mommaers (Peeters Publishers, 2004)
 | ||
조민아
미국 에모리대학에서 구성신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미셀 드 세르토의 시각을 확대 해석해 중세 여성 신비가 헤데비치(Hadewijch)와 재미 예술가 차학경의 글을 분석한 연구로 논문상(John Fenton Prize)을 수상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