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한빛 피디 어머니 김혜영(사비나) 씨
“사람들은 모른다. 한빛 없는 퇴임과 퇴임 이후를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음을.... 한빛이 있었다면 ‘수고하셨어요. 이제 엄마는 자유인이에요’ 했을 거다. 한빛은 내가 퇴임 후 잘 살기를 진심으로 바랐을 거다. 나를 참 많이 이해해 주고 격려했던 아들이니까. ‘아, 이제는 마음껏 울 수 있겠구나.’ 내게 자유인이 된다는 감각은 이것뿐이었다. 이제 사랑하는 한빛을 마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마음대로 만날 수 있다.”(“네가 여기에 빛을 몰고 왔다” 한 구절)
2016년 10월, 자신이 일하던 방송사(tvN) 드라마 제작 현장의 노동 착취, 폭력 문제를 고발하며 세상을 떠난 이한빛 피디(프란치스코)가 있다.
그의 어머니 김혜영 씨(사비나)는 아들이 그리울 때마다, 아들 덕분에 다르게 만난 세상 속의 이야기, 아들에게 건낸 약속의 말들을 써 왔다. 그리고 지난 4월 18일, 이한빛 피디 죽음에 대한 공식 기자회견을 했던 날짜에 맞춰 그 말들을 모은 책을 냈다. “네가 여기에 빛을 몰고 왔다”(후마니타스)
이한빛 피디의 아버지는 현재 이한빛 피디 죽음에 대한 위로금으로 만든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29일간 국회 앞에서 단식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말 중학교 교장으로 퇴임한 김혜영 씨는 남편의 복식을 도우며 쉼 아닌 쉼의 기간에 마침 글들을 다듬어 책을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책을 낼 마음으로 집중적으로 글을 쓴 것은 아니었어요. 그동안 한빛이 그리울 때마다 쓴 80여 편의 글 가운데 50여 편을 골라내고 책을 내면서 새 원고를 덧붙여 만들게 됐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다시 알리는 것이라 최선을 다 했지만, 교정을 위해서 그 글들을 다시 봐야 하는 시간이 너무 힘들더군요. 퇴고를 미루고 미루다. 마지막 날에야 글을 다 보고는 탈진했어요. 그런데 막상 책이 나오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요. 한빛에게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았다는 생각. 이제 점 하나를 찍었다는 생각이에요.”
김혜영 씨는 아들의 이름을 “한빛이”가 아니라 “한빛”이라고 불렀다. 묘하게도 그 느낌은 어떤 절대적 존재를 칭하는 듯했다. 김혜영 씨는 “글을 보면서 처음에 흘렸던 눈물만큼 다시 흘렸던 것 같다”면서도, “책을 통해 한빛 같던 삶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를, 그리고 절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업히기도, 내가 다른 이를 업기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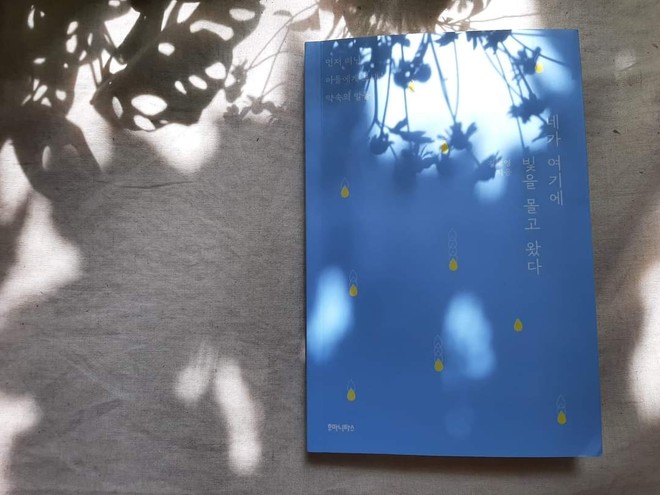
고백
이한빛 피디가 세상을 떠난 뒤, 동생 이한솔 씨가 김혜영 씨에게 말했다. “엄마, 엄마는 자식을 존중하고 믿어 줬잖아요. 그런 부모님은 많지 않아요. 나보다 형을 더 믿었으니 아마 형도 나처럼 고마워할 거에요.”
김혜영 씨는 가장 큰 후회로 남는 것 바로 자식을 너무 믿고 존중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취업을 한 뒤, 구체적으로 무엇을 괴로워 했는지 알지 못했고, 고된 일정 중에도 퇴근 뒤 구의역 참사 현장을 찾았다는 것도 나중에서야 알았다. 그래서 김혜영 씨는 “지금 여기에서 지금 당장 미루지 말고 손을 내밀고, 또 손을 잡아 주기를, 그렇게 홀로가 아니라 같이 손잡고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촬영장에서 스태프들이 농담 반 진담 반 건네는 ‘노동 착취’라는 단어가 가슴을 후벼 팠어요. 물론 나도 노동자에 불과하지만, 적어도 그네들 앞에선 노동자를 쥐어 짜는 관리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요. 하루에 20시간 넘는 노동을 부과하고 두세 시간 재운 뒤 다시 현장으로 노동자를 불러내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이미 지쳐 있는 노동자들을 독촉하고 등 떠밀고 제가 가장 경멸했던 삶이기에 더 이어가긴 어려웠어요.”(이한빛 피디가 마지막으로 남긴 글 일부)
김혜영 씨는 “아들 한빛이 정말 괜찮은 청년이었다는 걸 다시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선택을 했어야만 할까요?”라고 물었다. 그는 여전히 그런 아들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과 그래도 죽음은 아니라는 생각 사이에서 오간다.
“한빛이 공부하고 추구했던 가치들이 막상 사회에서 하나도 통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짓밟힐 때. 사람이 사람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믿음이 무너졌을 때, 그 안에서 살아야 하는 삶이 너무 경멸스러웠다는 고백을 보고 나는 한빛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네가 그곳을 나왔으면 될 것을. 그래도 죽어서는 안 됐었는데’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우리 한빛은 그게 어려웠을 거에요. 혼자만 살겠다고 나오는 것이요.”
김혜영 씨는 “옆에서 고통을 겪는 이들을 외면한다는 것을 못했을 아이,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 자신의 믿음을 배반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며, “이해하면서도 그 선택에 불쑥 화가 나고, 내가 곁에서 그 손을 잡아 주지 못했다는 후회가 점철된 날들”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또 말했다. “그래서인가, 그 아이가 없다는 것을 자꾸 잊어요.”
명예회복
이한빛 피디가 떠난 뒤, 사측은 그의 사인을 모독하고 왜곡했다. “평소 고인이 불성실하고, 우울증이 있었으며, 직원들과 관계도 좋지 않았다”는 식이었다. 믿을 수 없었다. “우리 한빛이가? 어떻게?” 회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나중에 함께 일했던 이들이 용기를 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언하고 나서 가족들은 사건을 공론화했다.
가족들이 사측에 요구한 것은 단지 “회사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었다. 돈에 관심 없는 이들이, 단지 사과와 잘못을 시인하는 것 말고는 바라는 게 없다는 것은 돈으로 문제 해결과 사과를 대신하던 거대한 기업에게는 의외로 곤란한 일이었을 것이다.
김혜영 씨는 공식 사과를 받은 뒤, 회사가 위로금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분노했다. 아들 한빛이 살아 돌아오는 것 말고는 아무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 돈 이야기를 왜 하는 거냐”고 펄쩍 뛰었다.
하지만 아버지 이용관 씨는 생각이 달랐다. 한빛이 고민했던 문제와 그 뜻을 이어가기 위해 법인재단을 만들자는 생각이었다. 그렇게 위로금 전액을 내 만든 것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다.

신앙.
“신앙이 없었다면 살지 못했을 겁니다.”
네 가족은 모두 가톨릭 신자다. 이한빛 피디는 초등학교 때 복사 활동을 했는데, 추운 겨울날 새벽 미사를 해야 할 때도 엄마가 데려다 주지 못하면 혼자서 뛰어가던 아이였다고 했다. 김혜영 씨는 이사를 하던 날, 이사 비용이 예산보다 적게 들자, 떠나려는 이사차량을 멈추고는 남은 돈을 들고 다니던 본당 성전건립기금으로 봉헌할 정도였다. 그렇게 지어진 봉안당에 아들 한빛이 먼저 잠들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을까.
그런 오랜 시간이 있어서일까. 미처 생각지도 못한 이한빛 피디의 봉안 시설을 정하지 못해 정신이 없을 때, 옛 본당의 신부님은 말 없이 성당 봉안당을 열어 줬고, 오월절과 겹친 추모식도 본당에서 할 수 있었다. 마침 김혜영 씨가 다녔던 학교와 성당이 가까워, 한빛을 매일 보러 갈 수 있었다고 했다.
김혜영 씨는 매일 성전에 앉아 울었던 시간은 오히려 평화로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하느님께 물었다. “왜 한빛을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한빛의 명예회복을 위해 도와 달라는 요청이었다.
왜 한빛을 데려갔느냐는 물음에 대한 답을 들었을까?
김혜영 씨는 “답을 찾지는 못했다. 다만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하느님이 아이를 그냥 데려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믿음”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뜻은 결국 “방송 노동자들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알리고, 한빛센터를 만들어 공론화하고 싸우게 된 일, 화려한 방송 화면 뒤에도 사람이 있고, 그들이 그 세계를 온몸으로 떠받치고 있다는 것을 알린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연대.
김혜영 씨는 한빛이 떠난 뒤 3년간 세상을 향해 문을 닫고 살았다. 하지만 지난해 말 국회 앞에서 단식하는 남편과 함께 있으면서 그는 연대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통해 많이 배우게 됐다는 그는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가 연대의 현장에 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책을 낸 뒤에 더욱 생각이 굳어졌다. 현직에서도 물러났으니 앞으로 죽는 날까지 모든 현장에 갈 것”이라며, “한 명이라도 더 힘을 실어 줘야 한다. 그것이 또한 한빛에 대한 빚, 감사함을 갚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빛을 보내기 이전과 이후의 세상이 너무 달라, 분노로 가슴에 고통이 올 정도였다는 그는 “특히 국회 앞 단식 농성을 지켜보면서 너무 참담했다. 주어진 역할을 다 하고 남에게 폐 끼치지 않으면 된다는 평범한 생각이 통하지 않는 세상, 이윤이 생명보다 앞서는 세상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김용균 씨, 최근 이선호 씨 사건을 보면서,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노동에 대한 교육을 시키지 못한 것이 너무 미안하다”며, 앞으로 말해야 할 모든 자리에서 이 일을 당부할 것 이라고 말했다.
김혜영 씨는 책의 마지막에 이렇게 썼다.
“나도 분에 넘치는 지지와 연대 덕분에 한빛 없는 세상을 견딜 수 있었다. 누구보다 내가 쓰는 글들을 꼬박꼬박 읽고 격려해 주는 한빛 때문에 알게 된 이들과 가장 가까이서 한빛 없는 세상을 버티게 해 준 동생 혜정과 혜란이 덕이 크다. 여기저기서 주는 겨울의 햇빛 같은 위로를 붙잡으며 조금씩 한빛에게 건넬 약속의 말들을 다듬어 나갈 수 있었다. 그래, 한빛아. 엄마도 네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게. 너를 가슴에 묻지 않고 부활시킨다는 약속, 늘 함께 있을 거란 약속 꼭 지킬게.”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