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애인을 잃어 비통해 하는 젊은 여자에게 인공지능(AI) 챗봇 회사가 놀라운 제안을 했다. 당신 애인이 당신에게 보낸 이메일, 함께 채팅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 디지털 데이터가 있으면 당신 애인과 다시 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 여자는 큰 기대를 하고 애인 생존 시에 주고받은 모든 데이터를 넘겼다. 며칠이 지났고 이제 여자는 AI 챗봇 회사가 만들어 준 맞춤형 챗봇에 들어가 다시 애인과 매일 매시간 채팅을 하고 있다.
‘데드봇(Deadbot)’은 사망자가 살아 있을 때 남긴 디지털 기록을 바탕으로 언어 패턴과 성격 특성을 시뮬레이션하는 AI 챗봇을 말한다. 물리적 육신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 사람이 남긴 디지털 데이터에 기초하여 데드봇을 만들면 실제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여기에 고인의 육성까지 결합되면 마치 아직 살아 옆에서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달로 이제 특정인의 음성, 성격, 언어 습관 등에 기초해 만들어진 맞춤형 챗봇을 활용하는 시대가 되었다.
데드봇이 등장하자 미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사랑하는 가족 등을 떠나보낸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사용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이별을 준비했지만, 사별 후에 닥친 공허감을 감당하지 못해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별에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데드봇에게 말을 걸어 슬픔을 이야기하면 데드봇은 적절한 위로를 건네준다. 위로의 내용과 표정은 누구에게서나 나올 수 있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것과 동일하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이별에 대한 수용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면서 위로를 받게 된다. 아직 채 이별의 슬픔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데드봇은 분명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이별의 아픔이 그대로 남아 있어 술이나 약물 또는 사이비 종교에 빠져 힘들어 하는 경우들을 생각하면 긍정적 측면이 많다.
그러나 이 데드봇 시스템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사용자가 데드봇의 사용기간을 제약 없이 설정할 경우 죽은 사람과 계속 생활하게 되면서 결국 일상적 삶으로의 복귀가 불가능하거나 오랜 기간 지체될 수 있다. 죽은 자에게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당해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현실 속에 존재하는 것처럼 생활하면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또 하나 중요한 논쟁점은 죽은 자의 권리에 관한 것이다. 데드봇은 철저하게 살아 있는 사람을 위하여 구축한 시스템이다. 죽은 자는 자신의 디지털 유산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모른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본인만의 데이터들이 결합되어 유령처럼 현실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채팅하고 대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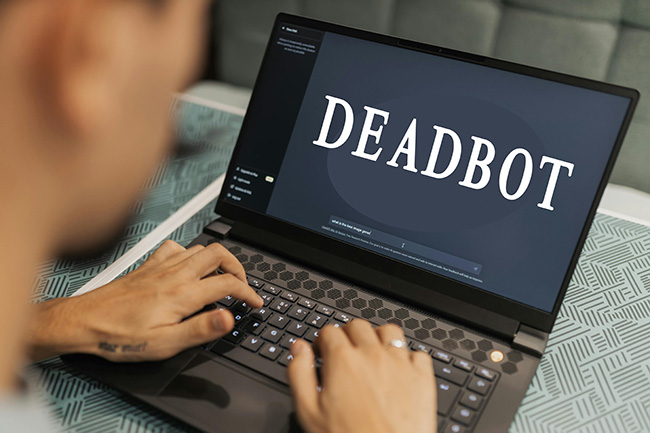
물론 아날로그 시절에도 어느 정도의 데이터는 유산으로 남아 있었다. 일기장이나 편지, 사진 몇 장이 남아 고인을 추모하는 매개로 이용되었다. 이런 아날로그 유품들 역시 유족에게 특정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유품들을 보면서 위로도 받고 함께한 시간들을 그리워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날로그 유품들은 일방적 메시지 전달에서 그치고 만다. 유품 주인공과 유품은 분명하게 구별되며 둘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다. 어느 순간에도 실시간으로 대화하지 않는다. 꿈 또는 환상 속에서 잠시 조우할 수는 있으나 그런 순간은 예기치 않은 시간에 벼락같이 나타났다가 번개처럼 사라진다.
데드봇이 우리에게 던지는 본질적 질문이 여기에 있다. 우리가 가상공간에서 누군가와 채팅을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현실 속에 존재하는 실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비록 같은 공간 안에 없다 할지라도 상호작용을 통해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 상대방은 데이터의 집합체가 아니고 상황에 따라 기분이나 감정이 달라질 수 있는 존재고 독서나 토론을 통해 이전보다 진전된 지적 수준을 보여 줄 수 있다. 즉 공간과 관계없이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있고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상을 호흡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데드봇은 결국 데이터의 결합일 뿐이다. 데이터들을 결합해 적절한 대답을 하지만 모두 알고리즘으로 생성한 AI의 결과물들이다. 인간과 같은 상호작용은 처음부터 기대할 수가 없다. 먼저 떠나보낸 대상은 분명히 사람인데 돌아온 것은 데이터의 집합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이 데이터는 위험하기까지 하다. 특정 AI 챗봇 회사는 데드봇을 사용하여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의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은밀하게 제품을 광고하는 경우도 있다. 또 아직 죽음에 대해 잘 모르는 어린아이들에게 죽은 부모가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 있다고 주장하여 사고의 혼돈을 가져올 수도 있다.
물론 데드봇의 순기능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슬픔에 빠진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은 지극히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무 힘든 경우에는 데드봇이 일시적 진통제가 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별을 인정하지 않거나 못하면서 기술의 힘으로 계속 관계를 유지하려는 그 의도가 결국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를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술 또는 기술의 결과물들은 어느 경우에도 인간이 겪는 삶과 죽음의 그 깊이를 알 수가 없다. 단지 진통제처럼 일시적 치료만 가능할 뿐이다.
생성형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이제 인간의 철학적 신학적 질문까지 AI가 답을 주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사람들은 스승이나 선배에게 물어보지 않고 챗지피티에게 물어보고 답을 얻는다. 그러나 모든 질문에 AI가 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AI는 학습의 결과물일 뿐이고 스스로 경험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다. 데드봇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 여기에 있다. 이제 죽음과 같은 극한의 이별도 챗봇을 통하여 위로 받는 존재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시공간을 소망하는 피조물답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른 공간으로 이전하는 과정이라고 계속 믿는 존재로 남을 것인가. 우리가 답해야 할 질문이다.

김홍열
연세대 졸업. 사회학 박사. 미래학회 편집위원.
저서 "축제의 사회사", "디지털 시대의 공간과 권력"
공저 "뉴사피엔스 챗GPT", "시그널 코리아 2024"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