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낭비사회의 좋은 소비]
“고객님, 저희 회사에서 항공권을 예매하셨습니다만, 서울에서 제주로 가는 거라서….”
“네? 그럴 리가 없는데…. 다시 한 번 봐 주시겠어요?”
지난 8월 말, 제주국제공항. 늦여름 휴가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는 인파로 공항은 발 디딜 틈 하나 없이 시끌벅적했다. 여섯 달을 제주에서 일하고 오겠다고 덜컥 선언하고 봄바람에 실려 섬으로 내려온 딸을 만나러 어머니가 왔다 돌아가는 길이었다. 오가는 항공권과 숙박 예약을 다 해 둔 차였는데, 들뜬 마음은 늘 의외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 법. 알고 보니 돌아가는 항공권이 아니라 서울에서 제주로 오는 항공권을 두 번 예매했지 무언가! 설상가상, 다음날까지 항공권은 전석 매진. 슬며시 건너다 본 엄마 얼굴에도 당혹감과 함께, 혹시나 딸이 미안해할까 내색도 못하고 안절부절못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급한 대로 스마트폰을 꺼내 항공사 예약 페이지를 띄워 이틀 후 첫 비행기를 예매했다. 소셜 커머스 사이트로 휘익 넘어가 어제 묵었던 숙소를 하루 더 예약했다.
엄마를 공항에 남겨 두고 리무진 버스에 올라 중문으로 오는 길, 많이 울었다. 평소엔 하지도 않던 실수를 저지른 내가 밉기도 했지만, 돌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엄두를 못 내고 우두커니 서 있기만 했던 엄마가 나이 먹어 가고 있구나, 늙어 가고 있구나 생각하니 두려워져서였다. 한편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물건과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이제 원시인 생활에서 깨어나라는 지인들의 반 협박에 떠밀려 마련한 스마트폰이 없었다면, 항공권을 발권하면서 결제 창에 입력할 체크카드 한 장 없었다면, 그날 엄마와 나는 어떻게 됐을까. 처음이었다. 무언가를 소비할 힘이 있다는 느낌에 감사하고, 갑자기 찾아오는 상황에 침착하게 대응하려면 여윳돈이라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실감한 것은. 그리고 역시 처음이었다. 부양해야 할 가족과 책임감에 비례해 앞으로 소비해야 할 물건과 서비스가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게 된 것은. 서른셋이 되어서야, ‘소비’라는 단어는 현실로 다가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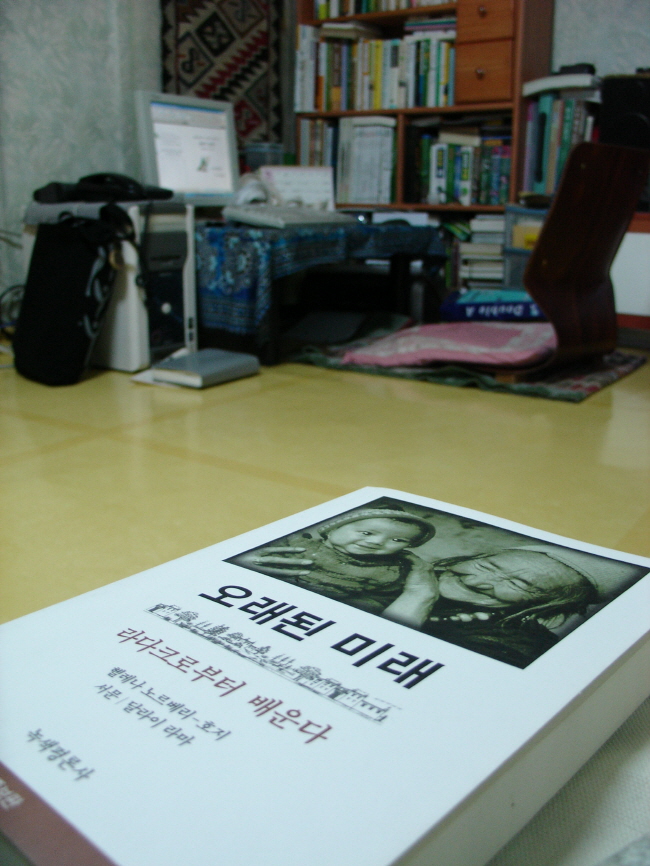
열여섯이었으리라. 부모님이 주는 돈으로 문제집도 사고, 떡볶이도 먹었던 평안한(!) 일상에 ‘가난’이니, ‘부도’니 하는 말들이 끼어들기 시작했던 때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방학마다 돈을 벌었다. 초콜릿 포장, CD 상자 조립, 과외, 백화점 판매직, 행사 진행 요원 등등. 돈 모으는 재미가 있었다. 낭창한 이십 대에 옷을 살줄도, 화장을 할 줄도 몰랐다. 반골 기질에 맑시즘이니 은둔 생활이니 자연친화적 삶이니 하는 말을 책에서 주워들은 후에는 책이나 샀지, 다른 데는 영 무심했다. 모아들이기만 했지 세상에 풀어 흐르도록 하질 못했다. 자본가를 스크루지라고 비난하면서도 정작 대담하게 돈을 내주고 물건이든 사람이든 끌어들이는 데 인색했다. 자본주의에 맞서 소비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도리어 돈이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는 평형 상태를 즐기기보다 늘 돈에 절절매는 찌질이였다.
삼십 대에 들어서며 돌아보니 소비 자체를 두려워했던 스스로와 만난다. 어디에 돈을 써야 스스로를 만족시킬 수 있고, 얼마큼 내주어야 자존감을 흐트러뜨리지 않을 수 있는지, 이십 대에 충분히 탐구하지 않았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두려움은 자존감을 낮추고, 그만큼의 소비를 동반한다. 돈이 없으면 사회에서 존재감이 사라질까 봐 악착같이 돈을 모은다. 미래의 안정을 위해 소비는 극도로 제한한다. 게다가 난 시골로 내려가 초야에 묻혀 자급자족하고 싶은 사람의 이미지를 유지해야 하니, 돈을 쓰는 건 그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니 매일 밤 편의점에서 한가득 인스턴트 음식을 사 와서 먹는다. 가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옷을 ‘지른다.’ 그리고는 또 후회한다.
지금은 위와 같은 무한반복의 습성을 깨부수고 기력이 딸린다(!) 싶으면 등심도 사다 구워 먹고, 가을 국화도 한 다발 사서 집에 꽂아 둔다. 제주에서 서울로 돌아올 때는 세례명을 새긴 나무 만년필도 선물해 주었다.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길찾기도 열심히 하고, 카톡 프로필도 자주 바꾼다. 이십 대 보다,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 소비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세상으로 흐르도록 자연스레 인정하고 놓아 준다. 제주에서 만난 친구에게 책 선물을 보냈다. 일터에서 나눠 먹으려고 도넛 한 상자를 샀다. 세월호에 대한 기록 영화를 만드는 데 작게나마 기부를 했다. 움켜쥐고 있을 때보다, 한결 평안해진다. 조금씩 나이를 먹으면서, 비혼 여성으로 살 준비를 하면서,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더 커진다. 허나 돈이 필요한 것과 돈을 적절히 소비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여유가 생겼다. 막연한 두려움을 넘어, 소비와 친구하여 넘실대는 세상의 파도를 탈 준비가 되었나 보다. 어쩌면 자본주의 사회가, 자본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러한 파도타기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고은지 / 자유기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