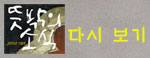[기획-밥벌이, 생계 이상의 의미]
소설가 김훈은 <밥벌이의 지겨움>(생각의 나무, 2004)에서 밥벌이에 대한 복음서의 이야기를 반박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며 “그들은 씨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거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먹이신다”고 하셨지만, 이 말을 김훈은 믿지 못하겠다 합니다. “하느님이 새는 맨입으로 먹여주실지 몰라도 인간을 맨입에 먹여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에게 밥벌이는 아무리 지겨워도 멈출 수 없는 살아있는 자의 운명적인 행위입니다. 남녀노소 귀천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먹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서 자장면을 먹는 걸인의 동작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에이프런을 두르고 거위 간을 먹는 귀부인의 동작은 같다. 그래서 밥의 질감은 운명과도 같은 정서를 형성한다.”
어디선가 김훈은 “사내가 된다는 것은 어디선가 제 밥벌이는 하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지요. 자못 비장하고 우울한 고백입니다. 삶이 그만큼 엄혹하다는 현실인식입니다.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꼬르륵 하고 의미 없는 유언을 남기고 죽어버리는 휴대폰을 떠올리며, “이 꼬르륵 소리는 대선사들의 오도송(悟道頌)보다도 더 절박하게 삶의 하찮음을 일깨운다.”고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하는 ‘진저리 나는 밥’을 버는 것은 그래서 하찮고, 그래서 거룩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감자 먹는 사람들’을 최고의 작품으로 삼는 것도 이유가 있었던 거지요. 광부들의 다 헤진 구두와 씨 뿌리는 사람의 등 뒤로 작열하는 태양도, 노동의 고단함과 밥벌이의 거룩함이 짝을 이룬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는 야고보 사도의 말은 좀 과하다는 느낌이지만, 밥벌이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남의 밥을 가로채는 데 익숙한 유한계급을 조롱하는 말이라면 그럴듯합니다. 독일 신비가 에크하르트는 “남의 것을 돌려주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빵을 먹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것과 함께 다른 사람의 빵도 먹어치우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남의 밥벌이를 빼앗은 것도 나쁘지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은 더욱 나쁩니다. 실업과 임금체불이 반복되는 사회는 그래서 악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직접 지으셨다는 <주님의 기도>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는 기도에 곧 이어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말할까, 생각해 봅니다. 지상에서 이루어질 하느님 나라는 ‘일용한’ 양식을 누구나 고르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나라겠지요. 우리는 살기 위해 먹어야 하고, 삶이란 먹을 것을 구하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김훈이 비장하게 ‘내 가족을 위한 나의 밥벌이’를 강조했다면, 예수님은 ‘모든 나’들을 위한 ‘우리들의 밥벌이’에 주목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 역시 ‘자신의 밥’을 위해 땀을 흘리셨다는 사실은 지금 ‘때로 지겨운 밥벌이’에 나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아버지[하느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했다고 하니, 인간의 목숨을 유지시키는 밥벌이는 하느님의 일이고, 예수님의 일이고, 우리들의 거룩한 과업이 되겠지요.
최근에 밥벌이에 나서다 해고당한 노동자들이 파업한 죄로 엄청난 돈을 회사에 배상할 처지에 몰렸습니다. 법원은 쌍용자동차 측이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140명의 노조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쌍용자동차에 33억114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거지요. 가난한 노동자의 밥그릇을 빼앗고, 이제는 집마저 저당 잡으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의 밥벌이는 너의 밥벌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평화로운 밥벌이를 위해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 놓습니다.
뜻밖의 소식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