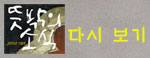[시사칼럼]
얼마 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놀란 일이 있다. 평소 안을 잘 들여다보지 않는데 하필 그 날은 수거통을 가득 채운 누런 물체와 눈이 딱 마주쳤다. 순간 구더기인 줄 알고 온 몸에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구더기라면 뚜껑을 열었을 때 밖으로 기어오르려고 할 텐데 바닥에만 얌전히 깔려 있는 모양이 이상했다. 차분하게 다시 들여다보았다. 밑에 있는 쓰레기가 하나도 보이지 않게 통 안을 빼곡히 채우고 있는 누런 물체는 현미였다. 쌀은 멀쩡해 보였다. 그 위로 내가 가져간 쓰레기를 버리려니 죄를 짓는 것 같아 잠시 망설였지만 눈을 질끈 감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부엌으로 돌아온 뒤로도 한동안 그 쌀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어서 밥이 되지도 못하고 쓰레기통에 버려졌을까. 쉰밥이 있으면 물에 깨끗이 빨아 끓여서라도 말끔히 드셨던 시어머님 생각이 났다. 내가 아이들이 먹다 남긴 밥을 절대 버리지 못하게 된 것도 쌀을 신앙의 성물처럼 귀하게 여기신 어머님 때문이었다. 집에 오시면 늘 쌀 항아리 뚜껑부터 열어보시며 혀를 끌끌 차시던 모습도 떠오른다. 쌀독에는 늘 쌀이 그득해야 안심이 되는 분이라, 소포장으로 쌀을 구입하는 막내의 살림살이를 옹색하고 위태롭게 여기셨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현미를 만난 날은 밥상용 쌀 수입 반대를 외치는 농민 시위대를 버스정류장에서 만나고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더 예민했는지도 모른다. 정부는 여전히 농민들 목소리에는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울려 퍼지는 매미소리만큼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관세율 513%로 쌀 시장을 개방해 더 이상 밥을 짓는 용도의 쌀을 의무수입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도 정부가 앞장서서 우리 쌀의 목줄을 졸라매고 있다는 게 농민들의 생각이다. 우리 창고에 쌀 재고가 쌓이고 있는 데도, 38선 너머에는 어린 아이들이 굶어죽고 있다. 그리고 서울 한복판에서는 음식물쓰레기 통에 쌀이 버려지고 있다. 그렇게 뜨겁고 불편한 여름이 지나가는 동안, 올해 극장가에 눈에 띄는 공포영화가 없었다는 사실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다. 스크린 밖 우리 밥상의 현실이 훨씬 더 무섭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래바람만 일던 거대한 옥수수 밭 앞에서 절망한 <인터스텔라>의 농부처럼, 지구를 버리고 다른 우주로 갈 수 없다. 제초제와 GMO 종자로 세계를 장악하려는 거대 식량자본의 이윤 때문에 대대로 우리를 먹여 살려온 이 땅의 논을 포기할 수도 없다. 요즘 내가 조합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한살림에서도 유기농 쌀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시중 쌀값이 터무니없이 낮아지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소비자들마저 그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는 모양이다. 벼농사를 포기하는 농부들 사이에서 그나마 우리 논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와 같은 유기농 생산지의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쌀값은 단순히 오늘 우리의 밥값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저축이자 보험료다.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된 뒤에도 이 땅에 건강한 논이 그대로 남아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갑을 열어야 한다. 그 논이 살아남아야 미꾸라지, 개구리, 붕어, 투구새우, 우렁이에서 백로까지도 모두 우리와 함께 살 수 있을 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