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_연대, 사회적 사랑
지난해 프란치스코 교종은 방한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기자들에게 이런 발언을 했다. “인간의 고통 앞에 서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게 된다. 어떤 이들은 이를 두고 ‘정치적 이유로 그렇게 한다’고 여기겠지만,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내버려둬라... 유가족들이 건넨 세월호 추모 리본을 반나절 정도 달고 다녔다. 그들과 연대하는 마음으로 달았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떼는 게 좋겠다.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고 대답했다.”(SBS 뉴스, 시사IN) 교종은 로마로 귀국하는 날까지 가슴에 세월호 추모 리본을 달고 있었다.
사회교리에서는 연대성을 이렇게 설명한다. 연대성은 “가깝든 멀든 수많은 사람들의 불행을 보고서 막연한 동정심 내지 피상적인 근심을 느끼는 무엇이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공동선을 위해 투신하겠다는 강력하고도 항구적인 결의이다. 우리 모두가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만큼, 만인의 선익과 각 개인의 선익에 투신함을 뜻한다.”(<사회적 관심>, 38항) 연대성은 정의의 영역 안에 자리하므로 근본적인 사회적 덕목 가운데 하나이다.(<간추린 사회교리>, 193항) 다시 말해서 연대는 감상적인 열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의지이며 모두가 추구해야할 정의이고 덕이라고 가르친다.
누구 편을 든다는 것을 편협하고 이해관계에 얽힌 졸렬한 태도로 간주하는 세상이다. 더욱이 사회적 약자나 피해자의 입장을 두둔하고 나서면, 사회 불만 세력에 동조하는 반사회적 처신으로 매도된다. 사심 없이 냉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중립’이야 말로 가장 가치있는 사회적 덕목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복음을 기둥으로 삼는 교회마저도 ‘중립’을 ‘고통 받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보다 우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교회의 수장인 교종께 거침없이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한 발언의 배경이 여기에 있다.
그러나 중립이 자칫 가해자와 기득권자의 악행과 불의, 폭력과 횡포를 방관하고 묵인하자는 선언이 될 위험이 있다. 요즘 중립이란 이름으로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을 미루고, 연대를 향한 투신을 불온하게 여기는 일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쯤 되면 가난한 이들과 연대하려는 마음을 먹을 때마다 엄청난 긴장과 갈등이 생긴다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연대하는 사람들을 자기과시와 허영에 빠진 영웅주의로 보거나, 자기모순과 사회적 불만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보는 편견이 걱정된다. 게다가 이런 사상적 검열을 극복해야 연대할 수 있으니 참 어려운 노릇이다. 그래서였을까. 2009년 용산 남일당 참사현장에 함께하기로 결정했을 때, 나는 사제로서 힘든 심리적 갈등을 겪었다. 내면의 목소리는 현장으로 호출하는데 내 몸과 의식은 거부하고 있었다. 살벌한 현장 상황에 대한 무서움뿐만 아니라 타인과 대중 앞에 나서는 두려움, 소심함, 부족한 자신감 등이 나를 사로잡았다. 합리적 이성이 나에게 연대를 독려하고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평온한 일상으로 퇴각하라고 다그쳤다. 교회는 중립의 자리에 있어야 하니, 여기서 이탈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었다.

그러나 용산참사 현장에 첫 발을 내딛고 난 이후 모든 일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고 풀려갔다. 오히려 나는 용산 유가족들과 동료 사제들에게 격려 받고 위로 받을 수 있었다. 하느님의 자비를 실천하려는 내 마음은 현장에서 더욱 고무되고, 나를 더욱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었다. 연대란 자신감과 용기로 가득한 투사의 덕이 아니라, 약하고 용기가 필요한 보통사람들의 눈부신 덕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무력한 이들은 연대를 통해 서로가 한 가족이며, 하나의 운명을 살아가는 형제들이었다. 그래서 성찬의 의미가 이곳에서 깊이 새겨졌고, 고통 속에서 희망을 발견했던 그리스도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강서 신부/ 서울대교구 삼양동 선교본당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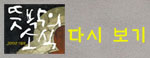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