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의 리얼몽상]
빨리 써야 하는 글이 있다. 빨리 나와 줘야 하는 영화도 있다.
'다이빙벨'은 그런 영화다. 아이들이 아직 2학년일 때, 부모들이 가슴에 달고 다니는 아이 사진이 든 명찰이 아직은 해 지난 것이 아닐 때 나와 줘야 했던 영화다. 이 절박함에 대해 한 번만이라도 공감했다면 '다이빙벨'은 그저 영화일 수 없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희망의 최후의 한 끝자락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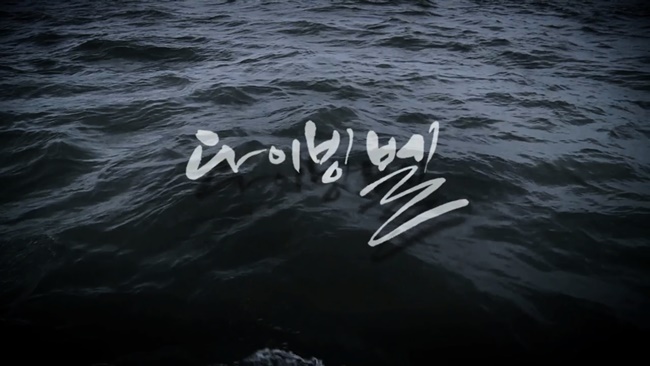
이것은 세월호에 갇혔던 아이들과 승객들을 위한 진혼곡이 아니다. 바다에 잠든 넋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무기력하다. 죄스러워 돌처럼 굳어 버린 지 이미 오래다. 우리가 입을 떼어 말을 할 수 있으려면, 그때 아이들을 위해 헛된 몸부림이라도 쳤던 기록이나마 남아 있어 줘야 한다. 그래도 뭐라도 했다는 최소한의 변명거리는 손에 잡혀야 되지 않겠는가.
이상호, 안해룡 감독의 '다이빙벨'은 가장 일찍 배달된, 우리의 그 헛된 몸부림의 기록이다. 바다에 근접조차 못하고 발만 동동 굴러야 했던 우리의 절망에 관한 영화다. 우리가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가장 원초적인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영화다. 질문은 한 줄이다. “왜 구하지 않았는가?” 답은 이제부터 줄기차게 찾아내야 한다. 처음 배달된 영화의 임무란, 모두의 기억이 선명하게 살아 있을 때 공감대 형성의 기폭제가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정말로 구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몸부림
그냥 고맙게 봤다. 그리고 눈물도 흘렸지만 위안도 없지 않았다. 분명 자기 목숨을 걸고 누군가를 구하려 애썼던 사람들도 그때 팽목항에는 존재했었다. 정말 사람을 바다 밑 수십 미터로부터 구해 내고 살려서 함께 올라오고 싶었던 사람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볼 수 있었다.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할 수 있었다. 눈빛부터가 달랐다. 마음이 다르니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달랐다.

모두 안다. 바보들이나 이런 영화를 만든다. 어떤 날카로운 ‘평’들이 기다리고 있을 줄 뻔히 알면서도 6개월 안에 ‘설익은’ 영화를 만들고, 부산국제영화제가 예산 삭감돼 타격을 입을 위협 앞에서도 상영을 강행하고, 스크린이 전국에 몇 개 되지도 않아 관객을 마냥 발품 팔게 하는 영화가 '다이빙벨'이다. 바보에다 무모함까지 갖춰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개봉 닷새 만에 전국 19개관 42회 상영으로 1만 관객을 동원했다. 울보들이 또 펑펑 울게 될 줄 뻔히 알면서도 이런 영화를 줄 서서 기다려 가며 봐 주었기 때문이다.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바보 울보들, 그들을 위한 영화다. 우리는 영화 '다이빙벨'을 놓고 이제야 겨우 왜 그렇게까지 그 반년이 생지옥 같았는지를 ‘함께’ 느꼈을 뿐이다. 나만 이런 심정인 게 아님을 서로 헤아려 주는 공동의 이야기 하나를 만났을 뿐이다. 더 많은 사람이 보고 “나도 같은 마음”이라고 입술을 떼어 말하게 되기를 바란다. 잊지 않기 위해 뭘 했으면 좋겠냐고 막막해 하며 묻던 우리에게 할 일이 생겼다. 일단 '다이빙벨'을 보자. 보고 나서 이야기하자.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이다. 늦지 않았다.
 | ||
김원(로사)
문학과 연극을 공부했고 여러 매체에 문화 칼럼을 썼거나 쓰고 있다. 어쩌다 문화평론가가 되어 극예술에 대한 글을 쓰며 살고 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