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신학연구소, 월간 ‘갈라진 시대의 기쁜소식’ 창간
신학. 사전에는 ‘종교와 종교의 영향, 종교적 진리의 본성에 관한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라 정의된 단어다. 정의만 두고 보자면 연구자가 누구인지 따로 지정되어 있지도 않고, 연구의 목적도 따로 규정된 바 없지만, 현실적으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사제와 수도자들이다. 신을 향한 물음과 열정으로 신학을 공부한 평신도 또한 적지 않았지만, 실상 그들이 물음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공간은 교회 안에 많지 않았다. 게다가 신학의 언어는 지나치게 어려웠다. 삶에 가까운,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신학이 필요했다.
2014년 1월이면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신학연구소(소장 경동현, 이하 우신연)는 그런 필요에 대한 응답으로 젊은 평신도들의 힘을 모아 출발했다. “공동체인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신나고 쉬운 신학”이 ‘우리신학’인 것이다.
설립 후 10여 년 동안 우신연은 평신도와 사목을 주제로 한 포럼, 본당과 교구 및 수도회를 진단하여 시스템 변화를 제안하는 사목 컨설팅 등의 활동을 벌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신학 총서와 종교간대화 총서, 학술지 <우리신학>을 발행했고, 2002년 아시아신학연대센터를 만들면서는 매년 국제 심포지엄도 열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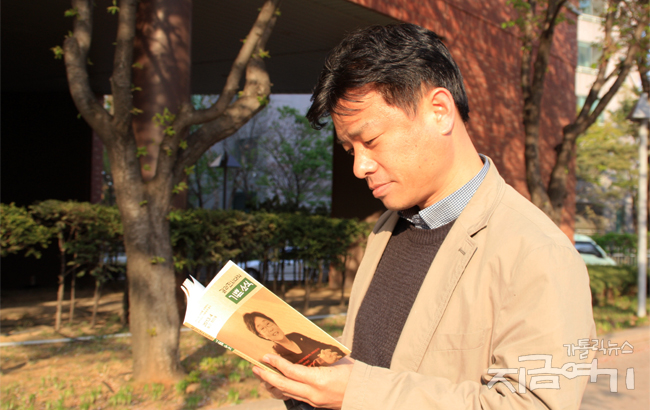
월간 <갈라진 시대의 기쁜소식>
공감 얻는 ‘현장신학’ 담고 싶다
지난 4월, 우신연은 잡지를 창간했다. 월간 <갈라진 시대의 기쁜소식>이다. 사실 <갈라진 시대의 기쁜소식>이라는 제호는 아주 오래된 이름이다. 우신연이 설립되기도 전인 1991년 9월, 강론자료를 모아 매주 사제들을 대상으로 배포했던 것이 시작이었다. 호응이 좋아 수익사업이 되기도 했고 연구소(당시 우리신학연구실)를 홍보하는 효과도 있었다. 후원회원을 모집하기 시작하던 2004년부터는 후원회원들에게도 발송했다. 하지만 연구소의 연구 성과를 담기에는 적합한 포맷이 아니었다. 고민 끝에, 월간지를 내기로 했다.
경동현 소장은 “연구소의 연구 내용이 보다 많은 이들에게 쉽고 편안하게 전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통 대학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학술지에 글을 써야 하잖아요. 연구 성과가 있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학술지에 실리는 글은 많은 이들이 읽는 글이 아니죠. 사람들에게 읽혀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게 ‘현장에 닿는 신학’이라는 연구소 취지와 맞아요. 또, 우리도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담아내고 싶기도 했고요.”
월간지 <갈라진 시대의 기쁜소식>을 펴내는 것은 우신연의 연구 과정 중 하나다. 예를 들면 창간호에서 다룬 ‘평신도 운동의 영성을 찾아서’와 ‘마을 속으로 들어간 본당’, ‘이야기로 떠나는 아시아 여행’ 등은 가볍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지만, 실은 우신연 연구원 각자가 자신의 연구 주제의 연장선상에서 집필하는 꼭지들이다.

월간지 중심의 협동조합도 꿈꿔
올해 우신연의 연구 주제는 크게 ‘평신도성’ 정립, 참여교회론, 한국 사회 공공성 회복과 교회의 역할 등 세 부분으로 나뉜다. 평신도성 정립에서는 평신도 영성과 평신도 인물 연구를, 참여교회론에서는 평신도 중심의 가톨릭 진보운동, 마을 살리기 운동과 본당 공동체, 한국의 유교문화와 교회의 남성중심주의 등에 주목한다. 공공성에 관해서는 이웃종교들과 함께 한국 종교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사례 연구, 종교의 보수적 윤리 담론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이런 연구 주제를 풀어내는 방법은 다양하다. 외부 프로젝트를 제출하기도 하고, 심포지엄을 열기도 한다. 6월에는 ‘인물로 보는 평신도 영성’이라는 강좌를 열 예정이다. <갈라진 시대의 기쁜소식>도 그 방법 중 하나다.
그러면서도 <갈라진 시대의 기쁜소식>은 여러 가지 글을 담아내는 ‘잡지’의 성격에 충실하다. 교회와 사회의 이슈가 된 민감한 문제에 대해 사제와 신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HOT vs COOL’, 시대의 스승인 이현주 목사에게 인생 고민을 묻고 답하는 ‘Q&A’, 종교와 맥주의 연관성을 탐구하는 ‘맥스(麥’s)’ 등 다양한 꼭지들을 마련했다.
우신연은 이 월간지를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 형태의 모임을 구상 중이다. 후원회원과 출자자들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하는 ‘열린 편집회의’와 이에 기반한 자발적 공동체를 뜻한다.
“학습협동조합 ‘가장자리’ 설명회에 다녀왔어요. 홍세화 선생 제안으로 만들어졌는데 독자 모임에서 스스로 공부도 하고 거기서의 성과물을 책으로 펴내는 구조지요. 아직 구상 단계에 있기는 하지만 <갈라진 시대의 기쁜소식>도 그런 형태로 가려고 합니다. 우신연의 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해요.”

우신연은 ‘씨앗 파는 종자 가게’
한국 천주교에서 ‘평신도가 중심이 된, 혹은 평신도만의 힘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활동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하물며 활동성과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연구소는 더 만만치 않다. 경동현 소장은 “불안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누군가가 시키는 의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해 나갈 수 있다는 게 우신연의 존재 이유”라고 설명했다.
경동현 소장은 연구소는 ‘씨앗을 파는 종자 가게’라고 말했다. 우신연의 첫 번째 후원회원인 김유철 선생이 말한 연구소의 정의다. 당장에 열매는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씨앗이 없으면 열매 맺기란 아예 꿈조차 꾸지 못할 일이다. 경동현 소장은 우신연의 씨앗이 무엇일지 계속 고민 중이라 했다. 언젠가는 ‘우리의 신학’이라는 열매를 맺고 싶다면서, 다만 그 열매를 맺기까지 “지름길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우신연 김항섭 이사장도 발간사에 이런 마음을 담았다.
“갈라진 시대, 어쩌면 더욱 더 갈라질 시대, 그리고 그 갈라진 틈이나 골이 쉬이 메워질 것 같지 않은 시대에, <갈라진 시대의 기쁜소식>이 새롭게 태어난다. 갈라진 시대에 어떤 것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답은 결코 쉽지 않다. 오랜 과정을 거쳐 고민하고 때로 좌절하고, 그 속에서 희망을 일구며 조금씩 다가서야 할 것 같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