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줌으로 하는 여성 영성 수업에서였다. 워낙 진지하고 열심히 수업을 듣는 자매들의 모습이 감동적이었는데, 이번 '기도' 수업은 내게 더 감동적이었다. 영성이란 학문적 바탕을 공부하는 일이, 사실 쉬운 듯하면서도 어렵다. 그래서 이 공부가 쉽다는 사람들을 나는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영성 공부는 경험이라는 차원이 늘 전제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영성을 잘 모른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숙제로 적어 놓은 글에 경험과 함께 깊은 의미가 가득 담겨 있는 경우가 많다. 이번 수업도 그러했다. 수업에 들어오는 자매들에게 자신의 기도생활을 돌아보고 기도 체험을 적어 보라고 과제를 내주었었다. 그리고 과제를 읽어 보다가, 기도 하나하나에 깃든 그들 삶의 아픔과 시련, 그리고 기쁨을 만나면서, 기도 영성을 오히려 내가 배우는 기분이었다. 매끄럽게 뽑아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점으로 된, 때론 가늘게 때론 굵게, 때론 밭게 때론 성글게 찍힌 점 사이사이에 생의 한숨과 아픔이 담긴 그런 기도의 자국들을 읽다가 갑자기 내가 부끄러워졌다. 나의 기도는 게으르고 너무 직업적인 것들일지도 모르니까.
그날 나는 루카 복음 5장의 깊은 데서 그물을 치라는 내용으로, 이냐시오식 기도를 소개하면서, 함께 복음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다른 어떤 때보다도 내게는 달콤한 시간이었고, 새로운 미션을 준비하는 내게는 의미심장한 기도 시간이었다. 그리고 간간이 줌으로 보이는 자매들의 기도하는 모습에 깊은 위로가 되었다. 기도 중 내 눈에 확 들어온 장면은 이제 결코 젊지 않은 베드로가 다소 불편한 듯, 어정쩡하게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모습이었다. 익숙한 강물, 그리고 익숙한 실패, 그리고 지친 몸을 이끌고 말이다.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는 말씀이 믿기지 않는 건 아닌데, 너무 무모한 여정이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되기도 했다. 자매들의 기도도 들었는데, 한 자매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충만함이 부담스러웠다고 했다. 알록달록한 물고기들, 배 두 척이 기우뚱할 만큼의 물고기를 보면서, 몸이 움츠러들고 힘이 들었다고 했다. 또 다른 자매는 겨우 일을 마치고 나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더 깊은 곳에 가라고 하시니 한숨이 나온다고도 했다. 아이들도 돌보아야 하고, 일도 해야 하는 젊은 엄마의 근심스런 현실이 더욱 깊이 다가온다.
내가 사는 이곳의 젊은 엄마도 기도 시간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다 보면 항상 잘리고 쪼개지는 시간 속에서 영성생활을 해야 한다. 그 와중에 자기 일을 하느라고 바쁜 엄마들이 주일학교를 활성화 하고 싶다면서 나를 찾아왔다.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고 싶은 이 엄마들에게 정말 존경심이 느껴졌다. 아이들에게 하느님께 대한 신나는 그리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주는 일이 정말 얼마나 멋진 일인지를 이야기하다가, 서툴러야 잘 보이는 하늘나라를 느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은 언제나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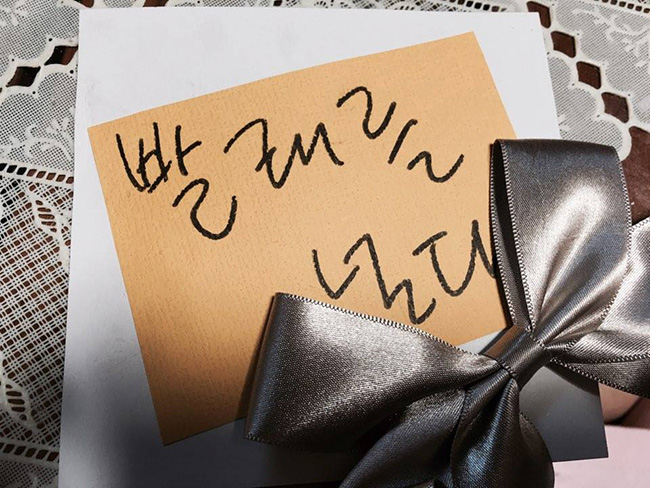
없는 시간을 쪼개어 하는 상황이기에 더 갈망하게 되는 걸까? 자신을 내어 주는 시간을 살아가는 젊은 어머니들의 다소 정신없어 보이고, 차분하지 않은 그 삶이 거룩해 보인다. 내 학생들도 그렇다. 어린아이를 돌보는 엄마의 경우, 줌 스크린으로 아기를 보여 주기도 하는데, 그렇게 아이를 안고 수업을 듣고, 또 페이퍼를 쓰고 하는 가난한 내 학생들의 삶도 거룩하다. 아이들 돌보고, 일을 하면서, 자기 공부를 해내는 많은 여성들에게 정말 박수를 쳐 주고 싶어진다. 그들은 대부분 아이들이 울거나 소리를 내니 음 소거를 하고 주로 듣는다. 나는 농담처럼, “너의 아기는 벌써 대학 수업을 듣네”라고 하면서, 아이의 울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여서 음 소거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했다.
아빠들도 육아를 많이 거들고 함께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여전히 육아는 여자의 몫이 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가지 하기 위해서는 더 힘들게 애를 써야만 한다. 그래도 많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신앙을 위해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니 기도는 분심해야 맞는 것 같다. 나도 기도하려고 마음을 모으고 내면이 좀 고요해지면, 무언가 막혀 있던 논문의 연결 부분이 바로 떠오르기도 하고, 또 수업 방식에 대한 신박한 생각이 떠오른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예수님의 공생활은 고달프고, 바빴으며, 또 그분의 하루는 얼마나 짧았을까 하는 점이다. 어느 곳에 집을 가지신 것도 아니고, 늘 돌아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셨다. 특히 마르코 복음을 읽으며 예수님의 하루를 바라보노라면, 장사익 선생의 노래 '삼식아'에 나오는 노랫말이 생각난다.
소낙비는 내리고요
업은 애기 보채고요
소코팽이 놓치구요
치마폭은 밟히구요
시어머니 부르구요
똥오줌은 마렵구요
어떤 날 엄마
어떤 날 엄마

시골의 고달픈 우리들의 엄마를 기억하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활을 연상한다면, 나는 너무 비속한가 하는 생각을 하다가, 중세의 신비가 여성들을 떠올린다. 영국 노리치의 줄리안 성당에서 살던 한 여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어머니, 생명을 낳아 주신 어머니를 보았고, 백년 전쟁을 치루던 당시의 세상, 불안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힘들어 하는 사람들을 향해, 어머니처럼, 모든 것을 잘될 거야, 어떤 일도 다 잘될 거야(all shall be well, all manner of things shall be well)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 어디 그뿐인가, 독일 마그데부르크에 살던 메히틸트라는 한 여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궁정의 귀부인으로 묘사했다. 자신은 다다를 수 없은 고귀한 여왕을 사랑하며 애타는 중세 기사의 마음이 되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관상했다.
그렇게 보면, 매일매일 일상을 허덕허덕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공생활은 어느 봄날의 바쁜 우리 엄마들을 닮았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수업 중 만나는 우리 젊은 얼마들의 힘들고 벅차다는 일상 속에서 공생활 중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그다지 불경한 일은 아닐 것 같다. 점점 바빠져 가는 현대의 삶을 일컬어 토머스 프리드먼은 "가속의 시대"라고 불렀다. 알아야 할 지식도 점점 가속화되고, 해야 할 일도 점점 급증하는 이 시대의 속도감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 이 세상 한가운데서 긴 기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은 드물 것 같다. 그래서 이 바쁨 속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퐁당퐁당한 일상 속에서, 기도를 갈망하는 젊은 엄마들의 열망 속에서 하늘나라를 본다. 하여 생각한다. 쪼개어진 기도, 그저 “주님” 하고 부르는 한번의 숨, 하늘을 잠깐 보는 그 한번의 눈빛 속에서 우리는 깊은 데로 가는 것이라고. 긴 기도가 아니고, 깊은 기도를 배우는 거라고.
 박정은 수녀
박정은 수녀
미국 홀리네임즈 대학에서 가르치며, 지구화되는 세상에서 만나는 주제들, 가난, 이주, 난민, 여성, 그리고 영성에 대해 관심한다. 우리말과 영어로 글을 쓰고, 최근에 "상처받은 인간다움에게: 나, 너 그리고 우리의 인문학"을 펴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