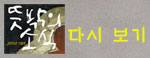카메라 버리기
[시사칼럼]
하도 시간이 빨리 가서 이미 오래전의 일이 되어버렸으나, 나는 꽤 오랫동안 이태리 로마에 머물렀었다. 우리나라 바깥이라곤 처음이었으니 모든 게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매일 매일 내가 보는 것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이고, 매일 매일 내 발걸음이 닿는 곳은 내가 처음 가보는 곳이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 차 있을 그 때, 호기심을 오랫동안 남기고 싶어 내 인생의 첫 카메라를 샀다.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그리고 내 눈 앞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어김없이 카메라를 꺼내 찍곤 했다. 내게 필요했던 것은 멋진 달력 사진이나 예술 사진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남기고 기억하는 것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보고 접하는 모든 것이 나의 평범하고도 단조로운 일상이 되어버렸고, 그 때 남기고 싶은 사진도 없어져 버렸다. 그러나 내 마음 속에 다른 어떤 것이 차지하고 있음을 깨달았는데, 그것은 사진이 아니라 카메라였다. 처음엔 작은 필름 카메라였지만 나중엔 디지털 카메라가, 그리고 언제부터인가는 값비싼 카메라가 내 두 손에 들려있었다. 내가 보는 세상을 남기고 싶은 마음보다는 더 좋은 카메라를 찾고 있는 내 모습을 보았다. 더 좋은 카메라, 더 많은 기능과 성능이 있는 카메라를 가지면 마치 내가 보는 세상이 달라질 수 있고 더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고백컨대, 그때 내 관심은 사진이 아니라 그냥 카메라였을 뿐이다. 되돌아보면, 호기심에 가득 찬 눈은 카메라가 필요했지만, 호기심이 사라진 눈엔 카메라라는 사물이 가지는 묘한 물신성(物神性)만 남은 것이다.
사실 우리의 소비생활을 돌아보면, 우리의 필요와 자연스러운 욕구를 넘어서서 사물 자체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 가치를 마치 자신인양 생각하거나 또는 그 사물을 가지면 자신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 필요에 의해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과 환상에 기초해서 소비하는 것이다. 이른바 명품이라고 불리는 옷과 가방이 그러하고, 어떠한 악조건도 뛰어넘을 자동차가 그러하며, “사는 곳이 나를 말해준다.”라고 광고하는 아파트가 그러하다. 이런 사물들을 생산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판타지(fantasy)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아주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맛과 취향도 사실은 명예와 지위획득의 사회적 ‘구별짓기’라는 사회적 관계에서 형성된다는 프랑스 사회학자 부르디외의 분석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판타지의 생산과 소비는 끝없는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후기산업사회의 자연적인 결과이기도 하다. 대량생산으로 이루어지는 풍요로운 사회는 쌓여있는 생산물을 처리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소비를 계속 부추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개인의 욕구와 욕망은 광고와 마케팅 기술에 의해 통합되고, 정교해지고, 양성될 수밖에 없다. 인간이 경제적 선택(특히 소비)을 할 때도 그러하고, 정치적 선택(특히 선거)을 할 때에도 그러한데, 주체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정보가 많은 것 같지만, 그 정보의 대부분은 광고와 정치 선전이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주체적으로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구조적으로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는 셈이다.
끝없이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사회, 그리고 끝없는 경제 성장 이데올로기의 덫에 걸린 사회를 극복하는 길은 그리스도교의 가난의 영성으로 돌아가는 길뿐이다. 물론 우리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거나, 그 극복 역시 개인의 책임이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욕망과 환상에 기초한 사회를 극복하는 것은 영성에서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좋은 사진은 값비싼 카메라에 의지하지 않는다. 좋은 사진은 대상에 대한 깊은 애정과 그 대상을 향해 한걸음 더 다가서는데 있다. 이것이 내가 값비싼 카메라를 어렵지 않게 포기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