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을 부르지 않는 기도, 공염불(空念佛)
[기획-당신의 기도, 당신의 하느님]
창녕 사는 농부시인 서정홍이 ‘밥 한 숟가락에 기대어’ 사는 게 인생이라 했다. “늙을수록 지은 죄가 많아 하품을 해도 눈물이 나온다.” 했다. 사는 게 때로 적막하고 이내 주름이 늘어난다. 이럴 때 말 한 자락 고요히 깔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싶다. 이럴 때 “당신 생각 어때요?” 묻고 기다릴만한 사람 하나 있음 좋겠다, 싶다. 사방이 가로막혀 답답할 때 그래도 언제든 한번 떠올릴만한 게 ‘기도’인가, 싶다. 그래서 ‘시편’엔 노상 연약하고 가련한 이들의 탄식과 원망, 위로와 희망이 가득한 모양이다. 현실이 만족스러울 때 기도는 액세서리가 되기 쉽지만, 당장 간절한 무엇이 있는 자에겐 ‘유일한 통로’가 기도다. 이들의 기도엔 관념이 없다. 진지한 삶이 기도를 받쳐준다.
소설가 김훈은 산문집 <바다의 기별> 말머리에 “어두운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가 혼자서 공을 차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적어놓았다. 마을에는 유리창마다 노란 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불빛 아래 모여 있는데, 아이는 빈 운동장에서 혼자서 공을 차고 있는 풍경. 공을 앞으로 차내고, 그 공을 쫓아가서 다시 차내면서 아이는 운동장을 이리저리 가로지르고 있다. 김훈은 날이 저물도록 운동장 가장자리에 앉아 이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는 긴 그림자를 끌고 다녔다. 아이가 공을 차면 그림자가 따라서 발길질을 했다. 아이는 그림자와 놀았는데, 그림자는 흉내만 낼 뿐 아이에게 대거리를 하지 못하니, 결국 아이는 그림자를 데리고 혼자 놀 뿐이다. 저녁 빛이 사위고 그림자가 사라지자 아이 혼자 공을 몰고 다니고, 아무도 그 아이를 부르지 않았다. 김훈은 이렇게 썼다. “아이의 놀이는 갈 길이 먼 수도승의 고행처럼 보였다. 아이가 먼저 돌아가기를 기다리다가 내가 먼저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아이에게 말을 걸지 못했다.”
기도란 그 아이와 그 사내가 서로가 서로에게 말을 걸기 시작할 때 발생한다. 그 아이가 왜 혼자서 공을 차고 있는지 묻는 것이다. 그 저물녘에 그 사내는 왜 운동장 가장자리에 앉아서 해가 사위어가도록 앉아 있었는지 묻는 것이다. 이들을 고독하게 운동장으로 내몰았던 사회적 현실이 무엇인지 헤아리는 것이다. 그들의 가난한 마음과 삶의 고단함, 생존의 갈피를 다독이며 알아채는 것이다. 상처가 아물도록 곁에 머물며 ‘우정’을 맺는 일이다. 김훈은 “모든, 닿을 수 없는 것” ... 품을 수 없고, 만져지지 않고, 불러지지 않고, 건널 수 없고, 다가오지 않는 것들을 “기어이 사랑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기도란 이런 것들을 부르고 만지고 품으려는 안간힘이다. 그래서 이젠 혼자여도 혼자가 아닌, 외로워도 외롭지 않은 ‘연대’의 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그게 사랑 때문이라서, 기도는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과 더불어 나누는 은밀한 기쁨이 된다.
미사전례를 행하면서 ‘보편지향기도’를 드릴 때는 세계평화를 위해 빌지만, 정작 전쟁과 기아와 가난으로 고통 받는 이들과 구체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때 우리의 기도는 관념으로 남을 뿐이다. 이런 기도는 행동을 낳지 못한다. 내 기도가 그 아이를,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해야만, 나에게서 ‘자비의 행동’이 나간다. 행동을 부르지 못하는 기도는 공염불이다.
뜻밖의 소식 편집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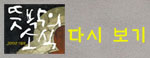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