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기획_연대, 사회적 사랑
4년 전, 첫 강의를 시작할 때만 해도 모바일인터넷은 학생들에게 흔치 않은 소지품이었다. 한국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미국 중서부의 이야기다. 지금은 거의 모든 학생들이 한두 개씩 갖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 수년 간 나는 학생들이 모바일인터넷에 서서히 중독되는 과정을 눈으로 보아 온 셈이다. 새삼 말해 무엇하랴만 으스스했다.
우선 학생들의 독해 능력이 확연하게 떨어졌다. 온라인이 제공하는 빠르고 단편적인 정보에 익숙해지다 보니 인내심을 요구하는 책들, 분석과 성찰을 요구하는 책들을 버거워한다. 그러나 독해 능력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관계 맺는 능력이 낮아진다는 점이다. 쉬는 시간을 주면 모두들 온라인으로 ‘순간 이동’한다. 강의실은 쥐죽은 듯 고요하다.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도 건네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 스무 명 남짓gks 작은 수업인데도 한 학기 내내 학생들끼리 서로 이름을 기억 못하고, 심지어는 얼굴조차 가물가물해 한다.
하기야 나 또한 이역만리 고향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테크놀로지의 덕을 톡톡히 보며 살아가고 있으니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을 꼰대처럼 잔소리나 할 양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다. SNS가 없다면 고향의 소식들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세월호를 둘러 싼 주류 언론의 흑색선전들을 분별해낼 수나 있었을까. 강정행정대집행이 벌어지던 그 밤의 일을, 쌍용차 고공농성의 하루하루를 지금 알기나 할까. 그래서 드는 질문이다. 우리는 과연 온라인에 익숙해지기 이전에 비해 ‘생각하지 못하고’, ‘관계를 맺지 못하고’, ‘감정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쩌면 전보다 더 풍부한 자극과 정보를 통해 ‘생각하고(혹은 생각한다고 착각하고)’, 더 다양하게 ‘관계를 맺고’, 더 격렬하게 ‘감정을 느낀’다. 그뿐이랴. 보드리야르의 표현을 빌자면 ‘시뮬라크르’로 현실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휴머니즘을 온라인에서 경험한다. 연민과 정의와 진실이, 가슴을 뜨겁게 하고 삶의 의미를 찾게 하고, 살 만하다고 느끼게 하는 모든 것들이 온라인 속에 다 있다.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 울고 웃고 분노하고 희망을 찾는다.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을 온라인을 통해 경험하면서 오프라인에까지 그 무거운 것들을 끌어올 필요성이 적어진다는 점이다. 대신, 오프라인을 굴러가게 하는 법칙은 효율성과 경제성, 실용성이다. 오프라인의 현실은 갈수록 건조해지고 단순해진다.
이러다 보니 '연대'에 대해 고민하며 온라인상의 연대가 갖는 양면성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기 어려워진다. 몸이 함께하기 힘든 여건에서 온라인의 연대는 필요하고 또 고맙다. 그러나 온라인 때문에 몸뿐 아니라 마음 또한 덜 내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전화 한 통을 넣을 수도 있고 손편지 한 통을 띄울 수도 있는데, 그저 이미지와 소식들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으로 마음의 부채를 덜어낸다. 그럼으로써 나도 남들과 ‘연대’한다고 스스로 위로하기도 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대 둘 다 필요하다. 손가락으로 연대하는 것과 살과 살을 맞대며 어깨를 걸고 밤공기를 견디는 것은 다르다. 이런 걸 모를 리 없건만 두 공간의 분열과 전도에 점점 익숙해지는 게 문제다.
예수는 굳이 자신의 몸을 내어 인간에게 왔다. 그는 효율성, 경제성, 실용성과는 거리가 멀다. 고통의 현장에 몸을 내어 함께하는 것이 힘들다면, 온라인 공간의 소우주에 나를 소진해 버리기보다 내 생활 반경 안에서라도 몸을 내어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저 옆 사람에게 말 한마디 건네고, 노란 리본 하나 가슴에 다는 작은 몸짓으로라도 말이다.
조민아 교수/평신도 신학자, 미국 세인트 캐서린 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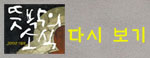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