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치지 않는 뜨거운 눈물, 고통 속에서
[기획_고통은 왜?]
“흘릴 눈물이 있다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이다. 시도 때도 없이 두 눈을 타고 내려와 내 완악한 마음을 다숩게 저미는 눈물, 세상에 남아 있는 것들과 세상 밖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하는 눈물, 언제부턴가 눈물은 내 시편들의 밥이 되어 버렸고, 나는 그 눈물과 마주하여 지금 아득한 시간 앞에 서 있다.”
고정희의 시집 <지리산의 봄> 서문에 나오는 글이다. 가난한 이들에게 슬픔과 고통이 일상이 된 지 오래되었다. 당장에 겪는 “왜 고통인가?” “왜 슬픔인가?”하는 질문 앞에서 “지금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느님의 위로를 받으리니”라는 복음서 구절은 그다지 힘이 없어 보인다. 바늘이 손톱 끝을 후비고 들어올 때처럼, 고통은 구체적이다. 이 고통이 쉽사리 그칠 것 같아 보이지 않을 때, 진통제마저 소용없다고 판단될 때,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절망뿐이다. 아프다, 아프다, 하는 소리마저 지를 수 없다.
사실 그리스도교 신앙은 불행의 낙인이 찍힌 ‘노예들의 종교’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그리스도교를 “바닥에서 기는 자들이 높은 자들에게 저항하는 종교”라고 말했다. 복음서에서는 수없이 “가난한 자들은 행복하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예수는 “주님의 영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말했고, 굶주린 이들이 행복한 세상, 하느님 나라를 설파했다는 이유로 반역죄에 걸려 넘어지셨다. 고대신화에서 신은 언제나 왕과 귀족을 상징했으며, 인간은 노예를 상징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 신앙은 “신이 인간이 되었다”고 가르친다. 왕이신 하느님이 노예인 인간이 되었다고 믿는 신앙이다. 왜? 노예인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교 신앙은 고통 받는 노예들에게 희망을 준다.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이집트 노예들의 하느님이었다. 예수조차 노예와 다름없는 노동자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루카 1,51-53)라고 노래한다. 게다가 예수는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고 선언했다.
예수는 이처럼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 영혼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필이면 그리스도교 신앙의 상징이 ‘십자가’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십자가는 반역자와 노예들에게 허락된 죽음의 형벌이며, 그들이 감당해야 할 현실의 상징이다. “사랑은 십자가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사랑하면 십자가에 이른다”는 말이 있다.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자면, 그들과 연대해야 하고, 그들과 연대하는 이들은 고통 받는 이들과 마찬가지로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뜻이다. 이 뜨거운 눈물, 이 안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은 희망을 노래한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며.
뜻밖의 소식 편집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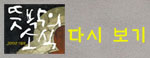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