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에서 들려오는 새 소리라니.... 그렇다면 내가 들고 있는 알 속에서 병아리가 나올 채비를 하고 있다는 건가? 순간 너무 놀라서 씻고 있던 알들을 당장 닭장에 도로 가져다 놓았다. 암탉들이 알들을 품어 주기를, 제발!!! 허나 오며 가며 아무리 지켜보아도 암탉들은 알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억지로 붙잡아다 알 위에 앉혀 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대체 이를 어쩌나. 걱정하던 차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기에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뭐라고? 한번 가서 볼게.”
아이들이 우당탕퉁탕 닭장으로 달려나가는가 싶더니 저희들끼리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고는 돌아올 때 다울이 손에 알 하나가 들려 있었다.
“어떡하려고 그래?”
“소리를 들어 보니까 이 알에서 소리가 나더라고. 작은 구멍도 하나 뚫려 있고. 엄마 닭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내가 대신 도와줄 거야.”
다울이는 암탉 대신 자기가 알을 품어 줄 작정인 것 같았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핀셋 같은 걸 가져다 달라고 했다.
“엄마, 병아리가 안에서 콕콕 쪼아대는 게 느껴져. 이럴 때 엄마 닭도 밖에서 쪼아 주지 않아? 나는 부리가 없으니까 핀셋 같은 걸로 껍질 깨는 걸 도와줘야겠어.”
다울이의 말에 ‘줄탁동시’라는 말이 떠올랐다. 그래, 지금 이 순간이 적극적으로 병아리를 도와주어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 나는 얼른 핀셋을 가져와 다울이에게 주었고, 다울이는 조심조심 이미 나 있는 작은 구멍 주변의 껍질을 핀셋으로 벗겨내기 시작했다. 정말이지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이 되는 순간으로 다랑이와 다나, 그리고 나는 눈 돌릴 틈 없이 숨을 죽이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쩌억! 갑자기 달걀 껍질이 크게 갈라지면서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과 함께 작은 핏덩이가 다울이 손에 담겨졌다. 핏덩이는 세상의 공기가 너무 춥게 느껴지는지 몸을 떨면서 삐잇삐잇 자꾸 울었다. 살짝 징그럽기도 하고 가련하기도 한 저 생명이 뭔가 도와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휴지로 핏물을 닦아 주는 것 말고는 뭘 해야 할지 눈앞이 깜깜한 우리들.... 서로 어쩌지 어쩌지 하다가 인터넷 검색에 들어갔다.

“아하, 알에서 깨어난 뒤에도 털이 마를 때까지는 알 품을 때와 마찬가지로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해 줘야 하는 거구나. 37도에서 39도 정도가 가장 좋다는데?”
내가 검색 결과를 발표하자마자 다울이가 윗옷을 들어 올려 병아리를 쏘옥 집어넣었다. 그러고는 옷으로 따뜻하게 감싸 주고 온도계를 달라고 소리쳤다. 온도까지 정확히 맞춰 가며 제대로 알을 돌보려는 모양인가 보다.
“와, 37도 정도 된다. 내가 기초 체온이 높아서 다행이네.”
다울이는 기뻐하며 병아리를 품은 채 꼼짝없이 앉아 있는 신세가 되었다. 우리들이 밭에 다녀오는 두 시간 동안 꼬박 그러고 있었단다. 엉덩이에 쥐가 날 정도로.... 그 결과, 우리가 돌아오자 짜잔! 하듯이 품에서 병아리를 꺼내 보여 주는데 털이 다 말라 뽀송뽀송 아주 귀여워졌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병아리 상태라고나? 아무튼 상태가 무척 좋아 보여서 마음이 놓였다. 다울이가 알을 품다니, 그렇게 해서 태어난 병아리가 내 눈 앞에 있다니! 세상에나, 어떻게 이런 일이!!!

깜짝 놀라고 기뻐서 날뛰다가 곧이어 걱정이 생겼다. 이렇게 어렵사리 세상에 온 병아리를 암탉들이 받아 주지 않으면 어쩌나 싶어서다.
“사람 냄새가 난다고 암탉들이 안 품어 주면 어쩌지?”
“맞아, 쪼아서 죽일 수도 있어.”
“그냥 우리가 집 안에서 키울까?”
“집 안에서 병아리를 키운다고?”
그 대목에서 정신이 번쩍! 그럴 수는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대신 꾀를 내어 암탉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게끔 병아리를 집어넣을 작전을 세우기로 했다. 작전 하나, 날이 어둑어둑해질 무렵에 닭장으로 들어간다. 작전 둘, 다랑이가 맛있는 쌀을 듬뿍 뿌려 닭들의 관심을 흩어 놓는다. 작전 셋, 그 사이 다울이가 병아리를 암탉 품에 넣어 준다.
작전 실행 결과는? 물론 대성공이었다. 암탉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고, 병아리는 다른 병아리들과 완벽하게 섞여 버렸다. 다울이 품에서 태어난 병아리가 누구인지 닭들은 물론 엄마인 다울이마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말이다. 그래서 참 다행이면서도 다울이는 못내 서운한 눈치였다. 자기 자식을 입양 보낸 엄마 마음과도 비슷한 걸 느끼는 걸까? 먼 발치에서라도 자기 자식을 알아보고 싶은 그 마음과 그러지 못하는 데서 오는 애틋함 같은 것.... 나는 다 헤아리지 못하고 짐작만 해 볼 따름이다.
그렇게 해서 다울이는 한동안 우리집 유정란을 먹지 못했다. 달걀을 먹으려고 하면 자기 품에 품었던 병아리 온기며 깃털의 촉감 같은 게 마구 떠오른단다. 그래도 두세 달이 지난 지금은 흰자는 먹을 수 있게 되었으니 세월이 좀 더 흐르면 다 잊어버리고 맛있게 먹게 되려나? 아니다. 잊을 만하면 또 닭이 알을 품을 테니 다 잊기는 어려울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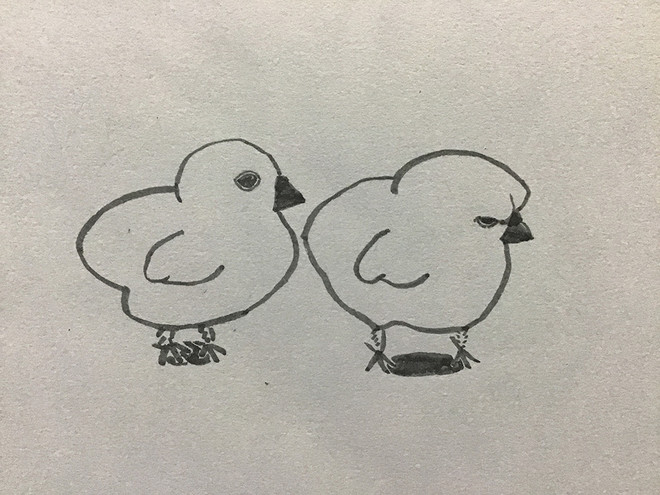

정청라
흙먼지만 풀풀 날리는 무관심, 무 호기심의 삭막한 땅을
관심과 호기심의 정원으로 바꿔 보려 합니다.
아이들과 동물들의 은덕에 기대어서 말이죠.
무구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명랑한 어른으로 자라나고 싶어요.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