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이 되는 앎, 중세 정치존재론 - 유대칠]
- 오캄의 정치학 읽기 2
십자군은 큰 짐이었다. 많은 병사들을 먹이고 무장시켜야 했다. 아주 많은 돈이 들었다. 그러나 교회란 전쟁을 하기 위해 돈을 쌓아 두는 곳이 아니다. 그러나 전쟁을 쉬려 하지 않았다. 그 많은 경제적 어려움은 민중의 몫이었다. 힘든 삶 앞에서 교회가 이야기하는 성지 예루살렘의 탈환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의문은 불만이 되고, 불만은 결국 분노가 되었다. 막상 전쟁의 그 큰 부담은 성직자가 아닌 국왕과 병사의 몫이었다. 이제 이들의 분노는 막기 힘든 지경에 이르게 된다.
13세기 몽골군의 침공 앞에 유럽의 민중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공포를 보았다. 경제체제도 장원제 중심의 농업 사회에서 도시 중심의 상업 사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었다. 농사만 할 줄 알던 이들에게 새로운 세상은 기회이며 공포였다. 혼란의 시기였다. 중세 유럽 곳곳에서 농민 봉기가 있었다. 농촌은 폐촌 현상으로 사라지고 화폐 중심의 도시 사회에 익숙해지지 않은 많은 이들은 사회적 낙오자가 되어 버렸다. 이런 시기에 교회는 돈을 요구한다. 십자군 전쟁을 하기 위해서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피에르 뒤부아(1255-1321)의 분노가 시작된다. 돈을 요구하기 전에 우선 교회 자체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소리쳤다. 사제들은 이미 심각한 부정부패에 빠져 있으며 종교적 가치와 거리가 먼 세속 권력욕에 물들어 더 이상 순수한 종교적 지도자로 보기 힘든 지경에 이르러 있었다. 우선 이 민중에게 돈을 요구하기 전 스스로의 개혁이 필요하다 분노했다. 화폐라는 편리한 수단의 등장으로 악행도 수월해졌다. 가난한 이를 위해 기부한 돈으로 수도자들은 스스로의 기쁨을 위해 사용했다. 도저히 성직자로 볼 수 없는 자격 미달의 사람이 성직자라며 큰소리를 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 피에르 뒤부아는 십자군 원정을 더 이상 민중의 것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교회와 수도원의 재산을 몰수하여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회의 권력과 국가의 권력을 구분하고, 더 이상 교회의 권력이 교회 자신의 신앙을 빌미로 민중의 삶을 관할하는 국가 권력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분노했다.

그는 교회의 아집으로 교회 스스로 이 사회의 악이 되어 가는 것을 두고 분노한 것이다. 그는 교회가 금지한 중세 이슬람 철학자인 아베로에스의 명제마저 대범하게 인용하며 자신의 분노에 힘을 주었다. 교회는 종교의 영역에서라도 빛이 되라고 말이다. 민중의 영역에서 빛이 되기는커녕 사회적 고통의 근원이 되는 교회에 대해 독하게 분노한 것이다. 그러면서 교회의 권력이 아닌 좋은 황제가 등장하여 지배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 했다. 흔히 중세의 대표 문인으로 알고 있는 단테 역시 자신의 정치철학에서 이 지상의 정치권력 중심은 교회권력이 아닌 국가권력이며, 국가권력의 중심은 좋은 황제라 했다. 단테도 피에르 뒤보아도 교회 권력에 크게 실망했던 것이다. 이들에게 이러한 것을 알게 해 준 것은 타락한 교회 그 자신이었다.
오캄(1285-1349)도 이러한 시기를 산다. 그는 유명론자다. 그에겐 ‘로마인’이나 ‘유럽인’은 그저 개념일 뿐이다. ‘보편제국’을 위해 산다지만, 그 ‘보편제국’이란 것은 인간의 개념 혹은 관념일 뿐이다. 하느님이 창조한 참으로 존재하는 것은 ‘로마제국’도 ‘유럽’이란 거대한 그 무엇이 아닌 바로 ‘나’라는 일인칭 단수 대명사로 지칭되는 작고 작은 개인이다. 하느님은 ‘인간’이란 종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대명사로 지칭되는 이 작은 개인을 창조했다는 말이다. 결국 제국이란 것도 이 작은 ‘나’들의 모임이다. ‘나’가 죽고 ‘나’가 무시되며, ‘나’의 행복을 조롱하는 공간은 더 이상 ‘나’에게 함께 함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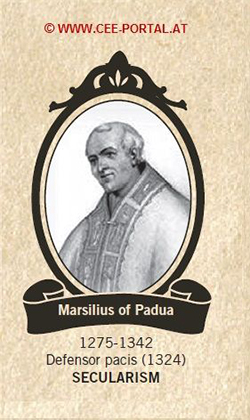
오캄과 마르실리오는 교회권력에게 묻는다. “도대체 무슨 권리로 나를 지배하려하는가?” 오캄과 마르실리오는 자신들의 소유욕만을 생각할 뿐, 일상의 힘겨움을 살아가는 수많은 ‘나’를 무시하는 교회에서 묻는다. “도대체 무슨 권리로 나를 지배하려 하는가?” 결국 교회도 국가도 ‘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나’들의 모임이고, 그들의 권력이란 것도 결국은 ‘나’들에 의하여 잠시 위임받은 것일 뿐이다. 결국 ‘나’라 존재가 참으로 있는 것이다. 이것이 오캄 유명론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21세기 지금 여기를 보자. 아직도 교회는 자신들의 기득권과 소유물을 위해 이 땅 가득 눈물 흘리는 그 수많은 ‘나’들로부터 고개 돌리고 선 것은 아닌가? 울고 있는 ‘나’들의 자리를 두지 않은 것은 아닌가? 집 없어 길가에 쓰러진 이들의 아픔에서 자신의 이권을 생각한 것은 아닌가? ‘나’들의 눈물은 뒤로 하고 그저 크고 큰 교회 건축물에서 거대한 신앙을 자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십자군 원정이란 이름에 숨어 자신의 기득권을 생각한 교회는 동시대 많은 ‘나’의 눈물이 되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중세의 교회, 과연 21세기 우리의 교회는 얼마나 이 땅의 ‘나’들을 안아 주고 있는가? 조용히 생각해 본다.
 | ||
중세철학과 초기 근대철학을 공부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논문과 책을 적었다.
혼자만의 것으로 소유하기 위한 공부보다 공유를 위한 공부를 위해 노력 중이다.
현재 대구 오캄연구소에서 작은 고전 세미나와 연구 그리고 번역을 하고 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