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행훈 칼럼]
지난 7일은 제59회 ‘신문의 날’이었다. 예년 같으면 신문회관에서 정부의 3부 요인과 언론계 대표들이 신문의 역할을 되새기는 축하 모임을 열었을 텐데 아무 행사 없이 지나갔다.
처음 겪는 일이다. 왜 그랬는지 이유가 궁금해서 인터넷에서 알아봤더니 ‘신문의 날’ 행사를 5월 중순으로 연기했다는 것이다. 한국기자협회에 의하면 행사장소 예약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좀 납득이 가지 않는 설명이었다. 국민의 비판이 많은 한국 신문의 현황을 반영하는 해프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두 달 전 공모한 ‘신문의 날’ 표어는 예정대로 3월 말 선정이 됐다. 당선작은“정보는 넘칠수록 신문은 더욱 돋보입니다”였고 우수상은 “세상이 속도를 말할 때 신문은 진실을 전합니다”였다. 오늘의 한국 신문에 딱 어울리는 표어라고 느끼지는 못했다. 앞으로 신문이 그랬으면 하는 바람을 표현한 것이라고 좋게 해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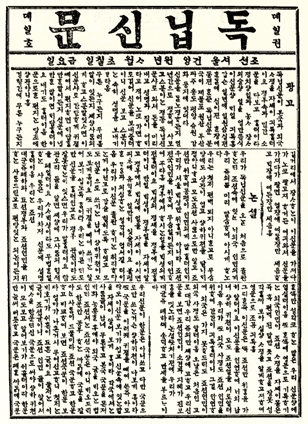
광복 70주년,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우리의 언론사를 되돌아보면 민족지를 자랑해 온, 가장 오래된 두 신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부끄러운 과거 행적이 새로 드러난 것이 충격적이다. 많은 국민이 몰랐던 수치스런 역사다.
두 신문은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려고 그들의 옛 신문을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그랬기 때문에 100년 가까이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적 사실들이 먼지를 털고 추한 민낯을 드러내서 충격이 더욱 큰 것이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에 반대해 동아일보에서 언론자유 투쟁을 벌이다 1975년 폭력배들에 의해 강제로 회사에서 추방된 뒤 40년째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되찾는 투쟁을 벌이고 있는 동아투위(東亞鬪委) 회원들이 조선 동아의 묵은 신문을 한부 한부 검색해서 조선, 동아대해부(大解剖) 10권(각 5권)을 출판함으로써 “민족지의 친일기록”이 세상에 공개된 것이다. 이 역사적인 사업에는 한국민주화의 기폭제 역할을 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함세웅 신부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
일제 강점기에 신문을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두 신문의 젊은 기자들은 창간 초기 나라 잃은 민족의 울분을 대변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일제의 압력을 이겨내기 힘들었다. 1940년 폐간이 가까워 올 때는 민족지의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됐다.
문제는 광복 뒤 이런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민족의 이해를 구했더라면 과거를 용서받고 새 출발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감추고 초기의 자랑스러웠던 지면만을 부각시켜 민족지였음을 외치고 친일 지면을 만들었던 사실은 두고두고 숨겨왔다. 정직하지 못한 행동이었다. 독자를 상대로 몽매주의(obscurantism)정책을 쓴 것이다.
유신체제에 대해서 동아는 다른 신문들과 달리 용감하게 싸웠다. 적어도 1975년 동아투위 기자, PD 130여 명이 쫓겨날 때까지는....
그러나 대부분의 신문은 유신독재를 찬양하고 그 하수인 역을 충실히 했다. 그런 형상은 박근혜 정권에 들어서서 다시 반복되고 있는 느낌이다. 물론 순종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면서....
언론은 민주주의의 초석이며 기둥이다. 언론자유와 독립언론이 없는 민주주의는 상상할 수 없다. 지금 한국에 언론자유가 있는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다행히 유신 때나 전두환의 5공 때 같은 언론인 구속이나 구타 같은 폭력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언론자유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공영방송은 완전히 정권의 통제를 받고 있다. 사장 임명과 낙하산 사장이 임명하는 보도 제작 간부를 통해 정권은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신문이나 방송매체의 편집국 기자나 PD들에게 집단적 편집권 독립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자유를 주장한다고 징계하고 해임하고 있다. 이건 언론탄압이다.
종편(종합편성) 채널은 보수 신문사의 계열방송으로 신문과 방송이 정부와 이념적으로 가까운 언론기업의 수중에 있다. 종편은 18대 대선 때 철저하게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편파방송을 했다. 조중동 신문도 박 후보를 지지했다. 종편은 그 대가로 광고 면에서 각종 특혜를 누리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종편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기타 방송의 심의에는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편파심의의 비판을 받고 있다. 정치뉴스를 검열하고 있다. 민주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행위다.
조중동은 종이신문 시장의 70퍼센트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종편을 허가해 주었다. 지나친 미디어 독점이다. 미디어 독점은 또 다른 형태의 언론자유 제약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방송을 정부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를 민주국가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래서 민주주의 옷을 입은 파시즘이라고 부른다. 지금 사이비 민주주의는 세계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언론자유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유다.
 | ||
장행훈(바오로)
파리 제1대학 정치학 박사,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초대 신문발전위원장, 현 언론광장 공동대표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